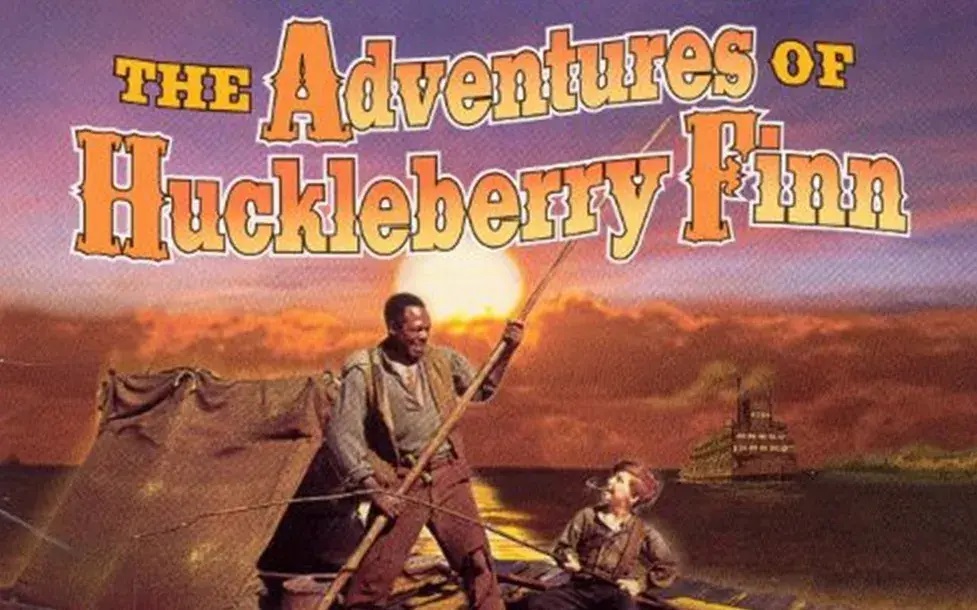|
구분
|
업체명
|
주
|
|
1
|
株式会社アーステクニカ
|
〒101-0051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2丁目4番地
|
|
EARTHTECHNICA CO., LTD.
|
2-4, Kand-Jinbocho, Chiyoda-ku, Tokyo 101-0051
|
|
2
|
株式会社IHI
|
〒135-8710東京都江東区豊洲三丁目1番1号 豊洲IHIビル
|
|
IHI Corporation
|
Toyosu IHI Building,1-1,Toyosu 3-chome,Koto-ku,Tokyo135-8710 Japan
|
|
3
|
アイコム株式会社
|
〒547-0003大阪市平野区加美南1-1-32
|
|
Icom Incorporated
|
1-1-32,Kamiminami,Hirano-ku,Osaka 547-0003
|
|
4
|
アイシン・エィ・ダブリュ株式会社
|
〒愛知県安城市藤井町高根10番地
|
|
AISIN AW CO, LTD.
|
10 Takane, Fujii-cho, Anjo, Aichi, Japan
|
|
5
|
アイシン精機株式会社
|
〒448-8650愛知県刈谷市朝日町2-1
|
|
Aisin Seiki CO., LTD.
|
2-1 Asahi-machi, Kariya, Aichi, 448-8650
|
|
6
|
IDEC株式会社
|
〒532-0004大阪府大阪市淀川区西宮原2丁目6番64号
|
|
IDEC CORPORATION
|
6-64, Nishi-Miyahara 2-chome, Yodogawa-ku, Osaka532-0004, Japan
|
|
7
|
IPGフォトニクスジャパン株式会社
|
〒223-0057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羽町920
|
|
IPG Photonics Japan Limited
|
920,Nippacho,Kohoku-ku,Kanagawa,223-0057,Japan
|
|
8
|
阿井物産株式会社
|
〒東京都杉並区上井草1-24-19 クレスト杉並
|
|
AI Corp.
|
Crest Suginami, 1-24-19, Kamiigusa, Suginami-ku,Tokyo
|
|
9
|
AIメカテック株式会社
|
〒301-0852茨城県龍ケ崎市向陽台五丁目2番地
|
|
AIMECHATEC,Ltd.
|
5-2, Koyodai, Ryugasaki-shi, Ibaraki-pref, 301-0852Japan
|
|
10
|
アキレス株式会社
|
〒160-8885東京都新宿区大京町22-5
|
|
Achilles Corp.
|
22-5, Daikyo-Cho, Shinjuku-Ku, Tokyo 160-8885, Japan
|
|
11
|
曙ブレーキ工業株式会社
|
〒348-8508埼玉県羽生市東5-4-71
|
|
AKEBONO BRAKE INDUSTRY CO., LTD.
|
5-4-71 Higashi, Hanyu-City, Saitama 348-8508
|
|
12
|
旭化成株式会社
|
〒101-8101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105 神保町三井ビルディング
|
|
ASAHIKASEI CORPORATION
|
1-105 Kanda Jinbocho, Chiyoda-ku, Tokyo 101-8101,Japan
|
|
13
|
旭化成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
〒101-8101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 1-105 神保町三井ビルディング
|
|
ASAHIKASEI MICRODEVICES CORPORATION
|
1-105 Kanda Jinbocho, Chiyoda-ku, Tokyo 101-8101,Japan
|
|
14
|
旭化成ファーマ株式会社
|
〒101-8101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一丁目105番地
|
|
Asahi Kasei Pharma Corporation
|
105 Kanda-Jimbocho 1-chome, Chiyoda-ku, Tokyo101-8101 Japan
|
|
15
|
株式会社アサヒ製作所
|
〒259-0142神奈川県足柄上郡中井町久所300番地
|
|
ASAHI SEISAKUSHO CO.,LTD.
|
300 Guzo,Nakai-machi,Ashigarakami-gun Kanagawa259-0142 JAPAN
|
|
16
|
アジレント・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
〒192-8510東京都八王子市高倉町9-1
|
|
Agilent Technologies Japan, LTD.
|
9-1, Takakura-Cho, Hachioji-shi, Tokyo, 192-8510Japan
|
|
17
|
アスカ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
〒634-0006奈良県橿原市新賀町201番地の2
|
|
Asuka Trading Co., LTD.
|
201-2, Shinga-cho, Kashihara, Nara 634-0006 JAPAN
|
|
18
|
アステラス製薬株式会社
|
〒103-8411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2-5-1
|
|
Astellas Pharma Inc.
|
2-5-1,Nihonbashi-Honcho,Chuo-ku,Tokyo 103-8411,Japan
|
|
19
|
アズビル株式会社
|
〒100-6419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丁目7番3号 東京ビル
|
|
Azbil Corporation
|
Tokyo Building 2-7-3 Marunouhi, Chiyoda-ku Tokyo100-6419
|
|
20
|
株式会社ADEKA
|
〒東京都荒川区東尾久7-2-35
|
|
ADEKA Corp.
|
2-35, Higashiogu 7-chome, Arakawa-ku Tokyo 116-8554, Japan
|
|
21
|
アドバンス電気工業株式会社
|
〒487-0031愛知県春日井市廻間町浦屋敷519-1
|
|
ADVANCE ELECTRIC COMPANY INC.
|
519-1,Urayashiki,Hazama-Cho,Kasugai-City,Aichi,487-0031,JAPAN
|
|
22
|
株式会社アドバンテスト
|
〒100-0005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丁目6番2号
|
|
ADVANTEST CORPORATION
|
1-6-2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Japan
|
|
23
|
株式会社アドマップ
|
〒103-0027東京都中央区日本橋2-3-4日本橋プラザビル
|
|
ADMAP Inc.
|
5F Nihonbashi Plaza Building 2-3-4 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7
|
|
24
|
アネスト岩田株式会社
|
〒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吉田町3176
|
|
ANEST IWATA Corp.
|
3176, Shinyoshida-cho, Kohoku-ku, Yokohama
|
|
25
|
アヴネット株式会社
|
〒150-6023東京都渋谷区恵比寿4-20-3 恵比寿ガーデンプレイスタワー23階
|
|
Avnet K.K
|
Yebis Garden Place Tower 23F, 4-20-3,Ebisu,Shibuya-ku,Tokyo,150-6023 Japan
|
|
26
|
アプライドマテリアルズジャパン株式会社
|
〒東京都港区海岸3-20-20 ヨコソーレインボータワー
|
|
Applied Materials Japan, Inc.
|
Yokoso Rainbow Tower 3-20-20 Kaigan, Minato-kuTokyo,
|
|
27
|
株式会社天辻鋼球製作所
|
〒大阪府門真市上野口町1番1号
|
|
AMATSUJI STEEL BALL MFG.CO., LTD.
|
1-1 Kaminoguchi-cho, Kadoma City, OSAKA, Japan
|
|
28
|
アラクサラネットワークス株式会社
|
〒212-0058神奈川県川崎市幸区鹿島田1丁目1番2号 新川崎三井ビル西棟
|
|
ALAXALA Networks Corporation
|
Shinkawasaki Mitsui Bldg.(West Tower) 1-1-2Kashimada, saiwai-ku, kawasaki, kanagawa, 212-0058 Japan
|
|
29
|
アリスタライフサイエンス株式会社
|
〒104-6591東京都中央区明石町8-1 聖路加タワー38-39F
|
|
Arysta LifeScience Corp.
|
38-39F St.Luke’s Tower, 8-1, Akashi-cho, Chuo-ku,Tokyo 104-6591 Japan
|
|
30
|
アルコニックス株式会社
|
〒100-6112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二丁目11番1号 山王パークタワー12階
|
|
ALCONIX CORPORATION
|
Sanno Park Tower 12th floor, 2-11-1Nagatacho,Chiyoda-ku, Tokyo 100-6112, Japan
|
|
31
|
アルパイン株式会社
|
〒145-0067東京都大田区雪谷大塚町1番7号
|
|
Alpine Electronics,Inc.
|
1-7,Yukigaya-otsukamachi,Ota-ku,Tokyo,145-0067,Japan
|
|
32
|
株式会社アルバック
|
〒神奈川県茅ヶ崎市萩園2500
|
|
Ulvac Inc.
|
2500 Hagizono, Chigasaki, Kanagawa, Japan
|
|
33
|
アルバック九州株式会社
|
〒899-6301鹿児島県霧島市横川町上ノ3313
|
|
ULVAC KYUSHU Corp.
|
3313Kamino Yokokawa-Cho Kirishima Kagoshima
|
|
34
|
アルバック・クライオ株式会社
|
〒253-0085神奈川県茅ケ崎市矢畑1222-1
|
|
ULVAC CRYOGENICS INCORPORATED
|
1222-1 Yqbata, Chigasaki, Kanagawa, 253-0085Japan
|
|
35
|
アルバックテクノ株式会社
|
〒253-8555神奈川県茅ヶ崎市萩園2609-5
|
|
ULVAC TECHNO, LTD.
|
2609-5Hagisono, Chigasaki, Kanagawa, 2538555,Japan
|
|
36
|
アルバック東北株式会社
|
〒039-2245青森県八戸市北インター工業団地六丁目1番16号
|
|
ULVAC TOHOKU, Inc.
|
6-1-16 North-Interchang Industrial Park HachinoheAomori 039-2245, Japan
|
|
37
|
アルファ・ラバル株式会社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2丁目12番23号
|
|
Alfa Laval K.K.
|
2-12-23 Kohnan,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38
|
アルプスアルパイン株式会社
|
〒145-8501東京都大田区雪谷大塚町1-7
|
|
Alps Alpine Co., Ltd.
|
1-7 Yukigaya-Otsukamachi, Ota-ku, Tokyo 1458501
|
|
39
|
株式会社アルプス物流
|
〒223-0057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羽町1756
|
|
Alps Logistics Co.,Ltd
|
1756,Nippa-cho,Kohoku-ku,Yokohama-shi,Kanagawa,223-0057 Japan
|
|
40
|
アンリツ株式会社
|
〒243-8555神奈川県厚木市恩名5-1-1
|
|
ANRITSU CORPORATION
|
5-1-1 Onna, Atsugi-shi, Kanagawa, 243-8555 Japan
|
|
41
|
アドバンス電気工業株式会社
|
〒487-0031愛知県春日井市廻間町浦屋敷519-1
|
|
ADVANCE ELECTRIC COMPANY INC.
|
519-1,Urayashiki,Hazama-Cho,Kasugai-City,Aichi,487-0031,JAPAN
|
|
42
|
株式会社アドバンテスト
|
〒100-0005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丁目6番2号
|
|
ADVANTEST CORPORATION
|
1-6-2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Japan
|
|
43
|
株式会社アドマップ
|
〒103-0027東京都中央区日本橋2-3-4日本橋プラザビル
|
|
ADMAP Inc.
|
5F Nihonbashi Plaza Building 2-3-4 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7
|
|
44
|
アネスト岩田株式会社
|
〒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吉田町3176
|
|
ANEST IWATA Corp.
|
3176, Shinyoshida-cho, Kohoku-ku, Yokohama
|
|
45
|
アヴネット株式会社
|
〒150-6023東京都渋谷区恵比寿4-20-3 恵比寿ガーデンプレイスタワー23階
|
|
Avnet K.K
|
Yebis Garden Place Tower 23F, 4-20-3,Ebisu,Shibuya-ku,Tokyo,150-6023 Japan
|
|
46
|
アプライドマテリアルズジャパン株式会社
|
〒東京都港区海岸3-20-20 ヨコソーレインボータワー
|
|
Applied Materials Japan, Inc.
|
Yokoso Rainbow Tower 3-20-20 Kaigan, Minato-kuTokyo,
|
|
47
|
株式会社天辻鋼球製作所
|
〒大阪府門真市上野口町1番1号
|
|
AMATSUJI STEEL BALL MFG.CO., LTD.
|
1-1 Kaminoguchi-cho, Kadoma City, OSAKA, Japan
|
|
48
|
アラクサラネットワークス株式会社
|
〒212-0058神奈川県川崎市幸区鹿島田1丁目1番2号 新川崎三井ビル西棟 Shinkawasaki Mitsui Bldg.(West Tower) 1-1-2Kashimada, saiwai-ku, kawasaki, kanagawa, 212-0058 Japan
|
|
ALAXALA Networks Corporation
|
|
49
|
アリスタライフサイエンス株式会社 Arysta LifeScience Corp.
|
〒104-6591東京都中央区明石町8-1 聖路加タワー38-39F 38-39F St.Luke’s Tower, 8-1, Akashi-cho, Chuo-ku,Tokyo 104-6591 Japan
|
|
50
|
アルコニックス株式会社 ALCONIX CORPORATION
|
〒100-6112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二丁目11番1号 山王パークタワー12階 Sanno Park Tower 12th floor, 2-11-1Nagatacho,Chiyoda-ku, Tokyo 100-6112, Japan
|
|
51
|
アルパイン株式会社 Alpine Electronics,Inc.
|
〒145-0067東京都大田区雪谷大塚町1番7号 1-7,Yukigaya-otsukamachi,Ota-ku,Tokyo,145-0067,Japan
|
|
52
|
株式会社アルバック Ulvac Inc.
|
〒神奈川県茅ヶ崎市萩園2500 2500 Hagizono, Chigasaki, Kanagawa, Japan
|
|
53
|
アルバック九州株式会社 ULVAC KYUSHU Corp.
|
〒899-6301鹿児島県霧島市横川町上ノ3313 3313Kamino Yokokawa-Cho Kirishima Kagoshima
|
|
54
|
アルバック・クライオ株式会社 ULVAC CRYOGENICS INCORPORATED
|
〒253-0085神奈川県茅ケ崎市矢畑1222-1 1222-1 Yqbata, Chigasaki, Kanagawa, 253-0085Japan
|
|
55
|
アルバックテクノ株式会社 ULVAC TECHNO, LTD.
|
〒253-8555神奈川県茅ヶ崎市萩園2609-5 2609-5Hagisono, Chigasaki, Kanagawa, 2538555,Japan
|
|
56
|
アルバック東北株式会社 ULVAC TOHOKU, Inc.
|
〒039-2245青森県八戸市北インター工業団地六丁目1番16号 6-1-16 North-Interchang Industrial Park HachinoheAomori 039-2245, Japan
|
|
57
|
アルファ・ラバル株式会社 Alfa Laval K.K.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2丁目12番23号 2-12-23 Kohnan,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58
|
アルプスアルパイン株式会社 Alps Alpine Co., Ltd.
|
〒145-8501東京都大田区雪谷大塚町1-7 1-7 Yukigaya-Otsukamachi, Ota-ku, Tokyo 1458501
|
|
59
|
株式会社アルプス物流 Alps Logistics Co.,Ltd
|
〒223-0057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羽町1756 1756,Nippa-cho,Kohoku-ku,Yokohama-shi,Kanagawa,223-0057 Japan
|
|
60
|
アンリツ株式会社 ANRITSU CORPORATION
|
〒243-8555神奈川県厚木市恩名5-1-1 5-1-1 Onna, Atsugi-shi, Kanagawa, 243-8555 Japan
|
|
61
|
アンリツインフィビス株式会社 Anritsu Infivis Co., Ltd.
|
〒243-0032神奈川県厚木市恩名5-1-1 5-1-1 Onna, Atsugi-shi, Kanagawa, 243-0032 Japan
|
|
62
|
E&E Japan株式会社 E&E Japan Co., Ltd.
|
〒162-0843東京都新宿区市谷田町2-7-15 近代科学社ビル7F Kindaikagakusha 7F, 2-7-15, Ichigayatamachi,Shinjuiku-ku, Tokyo, 162-0843, Japan
|
|
63
|
株式会社池貝 IKEGAI Corp.
|
〒茨城県行方市芹沢920-52 920-52, Serizawa, Namegata-shi, Ibaraki 311-3501Japan
|
|
64
|
池上通信機株式会社 IKEGAMI TSUSHINKI CO., LTD.
|
〒146-8567東京都大田区池上5-6-16 5-6-16 Ikegami, Ohta-ku, Tokyo 146-8567, Japan
|
|
65
|
伊藤忠ケミカル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ITOCHU CHEMICAL FRONTIER Corporation
|
〒107-0061東京都港区北青山二丁目5番1号 5-1,Kita-Aoyama 2-chome,Minato-ku,Tokyo 107-0061,Japan
|
|
66
|
伊藤忠商事株式会社 ITOCHU Corp.
|
〒107-8077東京都港区北青山2-5-1 5-1, Kita-Aoyama 2-chome, Minato-ku, Tokyo 107-8077, Japan
|
|
67
|
伊藤忠丸紅鉄鋼株式会社 Marubeni-Itochu Steel Inc.
|
〒103-8247東京都中央区日本橋一丁目4番1号 4-1 Nihonbashi 1-chome、Chuo-ku、Tokyo、103-8247、JAPAN
|
|
68
|
稲畑産業株式会社 Inabata & CO., LTD.
|
〒大阪市中央区南船場1-15-14 1-15-14 Minamisemba, Chuo-ku, Osaka 542-8558,Japan
|
|
69
|
イビデン株式会社 IBIDEN CO., LTD.
|
〒503-8604岐阜県大垣市神田町2-1 2-1 Kanda-cho, Ogaki, Gifu, 503-8604
|
|
70
|
イビデン産業株式会社 IBIDEN INDUSTRIES CO.,LTD.
|
〒503-0936岐阜県大垣市内原一丁目197番地 1-197,Uchihara,Ogaki,Gifu,503-0936,Japan
|
|
71
|
岩崎通信機株式会社 IWATSU ELECTRIC CO., LTD.
|
〒168-8501東京都杉並区久我山1-7-41 7-41, Kugayama 1-Chome Suginami-ku, Tokyo, 168-8501 Japan
|
|
72
|
岩谷産業株式会社 Iwatani International Corp.
|
〒105-8458東京都港区西新橋3丁目21番8号 21-8, Nishi-shimbashi 3-chome, Minato-ku, Tokyo,Japan
|
|
73
|
インターアクティブ株式会社 Interactive Corporation
|
〒103-0013東京都中央区日本橋人形町1丁目14 番8号 TT -1 ビルディング11階 TT-1 Building 11F 14-8, 1 –chome, Nihombashi-Ningyocho Chuo-ku, Tokyo 101-0013, Japan
|
|
74
|
株式会社インターテック INTERTEC CORP
|
〒108-0023東京都港区芝浦3-14-15 タチバナビル6F 6F Tachibana Bldg. 3-14-15 Shibaura Minato-ku TokyoJapan
|
|
75
|
ヴィスコ・テクノロジーズ株式会社 ViSCO Technologies Corporation
|
〒105-0022東京都港区海岸1-11-1 1-11-1 Kaigan, Minato-ku, Tokyo
|
|
76
|
ウインボンド・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Winbond Electronics Corp.Japan
|
〒222-0033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横浜二丁目3-12 新横浜スクエアビル9階 Shin-Yokohama Square Bldg.,9F,2-3-12,kohoku-ku,yokohama,JAPAN,222-0033
|
|
77
|
ウシオ電機株式会社 USHIO INC.
|
〒100-8150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6-5 1-6-5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8150
|
|
78
|
国立研究開発法人 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182-8522東京都調布市深大寺東町7-44-1 7-44-1 Jindaiji Higashi-machi, Chofu-shi, Tokyo 182-8522
|
|
79
|
宇部興産株式会社 Ube Industries, LTD.
|
〒105-8449東京都港区芝浦1-2-1 シーバンスN館 Seavans North Bldg., 1-2-1 Shibaura, Minato-Ku,Tokyo, 105-8449, Japan
|
|
80
|
宇部興産機械株式会社 Ube Machinery Corp., LTD.
|
〒755-8633山口県宇部市大字小串字沖ノ山1980 1980 Aza Okinoyama, Oaza Kogushi, Ube,Yamaguchi 755-8633, Japan
|
|
81
|
エア・ウォーター・マテリアル株式会社 Air Water Mateials Inc.
|
〒812-0036福岡市博多区上呉服町 10番1号 博多三井ビル2F Hakata Mitsui Building 2F, 10-1, Kamigofukumachi,Hakata-ku, Fukuoka 812-0036
|
|
82
|
エイケイテクノス株式会社 AK Technos CO., LTD.
|
〒578-0957大阪府東大阪市本庄中2-3-28 2-3-28 Honjo-naka, Higashi-Osaka, Japan
|
|
83
|
AGCセイミケミカル株式会社 AGC Seimi Chemical CO., LTD.
|
〒253-8585神奈川県茅ヶ崎市茅ヶ崎3-2-10 3-2-10, Chigasaki, Chigasaki-City, Knagawa, 253-8585, Japan
|
|
84
|
株式会社HGSTジャパン HGST Japan, Ltd.
|
〒252-0888神奈川県藤沢市桐原町1番地 1 Kirihara-cho,Fujisawa-shi, Kanagawa, 252-0888Japan
|
|
85
|
株式会社エイチ・ティー・エル HTLCo.Japan Ltd.
|
〒190-0012東京都立川市曙町2-16-6 2-16-6Akebono-cho,Tachikawa city,Tokyo Japan
|
|
86
|
AGC株式会社 AGC Inc.
|
〒100-8405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一丁目5番1号 Shin-Marunouchi Bldg.,1-5-1Marunouchi Chiyoda-ku,Tokyo 100-8405 Japan
|
|
87
|
SCSK株式会社 SCSK Corporation
|
〒135-8110東京都江東区豊洲3-2-20 豊洲フロント 3-2-20, Toyosu, Koto-ku, Tokyo 135-8110,, Japan
|
|
88
|
株式会社エスビーティー SBT Co., Ltd
|
〒220-0004神奈川県横浜市西区北幸2丁目10-36 KDX横浜西口ビル7F Yokohama KDX Bldg. 7F, 2-10-36, Kita-saiwai, Nishi-ku,Yokohama, 220-0004, Japan
|
|
89
|
エスペック株式会社 ESPEC Corp.
|
〒530-8550大阪市北区天神橋3-5-6 3-5-6, Tenjinbashi, Kita-ku, Osaka, Japan 530-8550
|
|
90
|
エドワーズ株式会社
|
〒276-8523千葉県八千代市吉橋1078番地1
|
|
91
|
NECネッツエスアイ株式会社 NEC Networks & System Integration Corp.
|
〒112-8560東京都文京区後楽2-6-1 2-6-1 Koraku, Bunkyo-ku, Tokyo 112-8560, Japan
|
|
92
|
NECエンベデッドプロダクツ株式会社 NEC Enbedded Products, LTD.
|
〒108-0073東京都港区三田1-4-28 4-28, Mita 1-Chome, Minato-ku, Tokyo 108-0073,Japan
|
|
93
|
NECスペース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NEC Space Techonologies, Ltd.
|
〒183-8551東京都府中市日新町1-10 NEC府中事業所内 10, Nisshin-cho 1-chome, Fuchu, Tokyo 183-8551,Japan
|
|
94
|
NECソリューションイノベータ株式会社 NEC Solution Innovators, Ltd.
|
〒136-8627東京都江東区新木場1-18-7 1-8-17 Shinkiba, Koto-ku, Tokyo 136-8627 Japan
|
|
95
|
NECディスプレイ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NEC Display Solutions, LTD.
|
〒108-0073東京都港区三田一丁目4番28号 4-28.Mita 1-chome.Minato-ku.Tokyo. 108-0073 Japan
|
|
96
|
NECフィールディング株式会社 NEC Fielding., LTD.
|
〒東京都港区三田1-4-28 1-4-28 Mita, Minato-ku, Tokyo
|
|
97
|
NECプラットフォームズ株式会社 NEC Platforms, Ltd.
|
〒213-8511神奈川県川崎市高津区北見方2-6-1 2-6-1, Kitamikata, Takatsu-Ku, Kawasaki, Kanagawa213-8511, Japan
|
|
98
|
NXPジャパン株式会社 NXP JAPAN LTD.
|
〒150-6024東京都渋谷区恵比寿4-20-3 4-20-3,Ebisu,Shibuya-ku,Tokyo 150-6024
|
|
99
|
株式会社NTKセラテック NTK CERATEC CO.,LTD.
|
〒981-3292宮城県仙台市泉区明通3-24-1 3-24-1 Akedori, Izumi-ku, Sendai, Miyagi 981-3292,Japan
|
|
100
|
エヌ・ティー・ケ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株式会社 NTK International Corp.
|
〒東京都港区西新橋2-5-11 NTKビル NTK Bldg., 2-5-11,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03, Tokyo
|
|
101
|
株式会社NTTファシリティーズ NTT FACILITIES, Inc.
|
〒108-0023東京都港区芝浦3-4-1 グランパークタワー Granparktower, 3-4-1 Shibaura, Minato-ku, Tokyo,Japan, 108-0023
|
|
102
|
NTN株式会社 NTN Corp.
|
〒550-0003大阪市西区京町堀1-3-17 3-17, 1-chome, Kyomachibori, Nishi-ku, Osaka
|
|
103
|
NTT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NTT Electronics Corp.
|
〒221-0031神奈川県横浜市神奈川区新浦島町1-1-32 ニューステージ横浜 New Stage YOKOHAMA, 1-1-32 Shin-urashimacho,Kanagawa-ku, Yokohama-shi, Kanagawa, 221-0031
|
|
104
|
エヌ・ティ・ティ・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 NTT Communications Corporation
|
〒100-8019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2-3-1 2-3-1 Otemachi,Chiyoda-ku, Tokyo 100-8019,Japan
|
|
105
|
エヌ・ティ・ティ・コムウェア株式会社 NTT Comware Corp.
|
〒108-8019東京都港区港南1-9-1 NTT品川TWINS アネックスビル NTT Shinagawa TWINS Annex Bldg., 1-9-1 Konan,Minato-ku Tokyo 108-8019, Japan
|
|
106
|
株式会社エヌ・ティ・ティ・データ NTT DATA Corp.
|
〒東京都江東区豊洲3-3-3 豊洲センタービル Toyosu Center Building, 3-3, Toyosu 3-chome, Koto-ku, Tokyo 135-6033
|
|
107
|
株式会社NTTドコモ NTT DOCOMO,INC.
|
〒100-6150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1-1 11-1, Nagata-cho 2-chome, Chiyoda-ku, Tokyo 100-6150 Japan
|
|
108
|
株式会社荏原製作所 Ebara Corp.
|
〒144-8510東京都大田区羽田旭町11-1 11-1 Haneda Asahi-cho, Ohta-ku, Tokyo 144-8510,Japan
|
|
109
|
株式会社エフ・シー・シー F.C.C. CO., LTD.
|
〒静岡県浜松市北区細江町中川7000番地の36 7000-36 NAKAGAWA, HOSOE-CHO, HAMAMATSU-CITY, SHIZUOKA-PREF.431-1394, Japan
|
|
110
|
FDK株式会社 FDK Corp.
|
〒105-8677東京都港区新橋5-36-11 5-36-11 Shinbashi, Minato-ku, Tokyo 105-8677, Japan
|
|
111
|
エムアールエム株式会社 MRM CO.,LTD.
|
〒491-0365愛知県一宮市萩原町西御堂中江西22番地 22 Nakaenishi,Nishimidou,Hagiwara,Ichinomiya-shii,Aichi, 491-0365,JAPAN
|
|
112
|
エムテックスマツムラ株式会社 MTEX MATSUMURA Corp.
|
〒山形県天童市北久野本1-7-43 1-7-43, Kita-kunomoto, Tendo-shi, Yamagata-ken
|
|
113
|
株式会社エルモ社 Elmo CO., LTD.
|
〒467-8567愛知県名古屋市瑞穂区明前町6-14 6-14, Meizen-cho, Mizuho-ku, Nagoya, 467-8567,Japan
|
|
114
|
株式会社エレニックス Elenix Inc.
|
〒252-0002神奈川県座間市小松原2-26-18 2-26-18,Komatsubara,Zama-shi,Kanagawa 252-0002,Japan
|
|
115
|
エレマテック株式会社 Elematec Corporation
|
〒108-6319東京都港区三田三丁目5番27号 住友不動産三田ツインビル西館19階 19F, Sumitomo Fudosan Mita Twin Bldg. West Wing 3-5-27, Mita, Minato-ku, Tokyo
|
|
116
|
エンシュウ株式会社 Enshu Limited
|
〒432-8522静岡県浜松市南区高塚町4888番地 4888, Takatsuka-cho, Minami-ku, Hamamatsu-city,Shizuoka-ken 432-8522, Japan
|
|
117
|
オークマ株式会社 OKUMA Corp.
|
〒480-0193愛知県丹羽郡大口町下小口5-25-1 Oguchi-cho, Niwagun, Aichi 480-0193, Japan
|
|
118
|
OKK株式会社 OKK CORPORATION
|
〒664-0831兵庫県伊丹市北伊丹8丁目10番地1 8-10-1, Kita-Itami, Itami, Hyogo 664-0831 Japan
|
|
119
|
株式会社大阪チタニウムテクノロジーズ OSAKA Titanium technologies CO., LTD.
|
〒兵庫県尼崎市東浜町1 1, Higashihama-cho, Amagasaki-shi, Hyogo 660-8533Japan
|
|
120
|
オー・ジー株式会社 OG Corporation
|
〒532-8555大阪府大阪市淀川区宮原4-1-43 4-1-43,Miyahara,Yodogawa-Ku,Osaka 532-8555,JAPAN
|
|
121
|
大塚化学株式会社 Otsuka Chemical CO., LTD.
|
〒540-0021大阪市中央区大手通3-2-27 3-2-27 Otedori, Chuo-ku, Osaka
|
|
122
|
岡谷鋼機株式会社 OKAYA & CO.,LTD
|
〒460-8666名古屋市中区栄2丁目4番18号 4-18 Sakae 2-chome, Naka-ku, Nagoya 460-8666
|
|
123
|
株式会社沖データ Oki Data Corp.
|
〒108-8551東京都港区芝浦4-11-22 4-11-22 shibaura minato-ku tokyo 108-8511Japan
|
|
124
|
沖電気工業株式会社 Oki Electric Industry CO., LTD.
|
〒105-8460東京都港区虎ノ門1-7-12 7-12, Toranomon 1-Chome Minato-ku Tokyo
|
|
125
|
沖電線株式会社 Oki Electric Cable CO., LTD.
|
〒211-8585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下小田中2-12-8 2-12-8 Shimokodanaka, Nakahara-ku, Kawasaki
|
|
126
|
オクサリスケミカルズ株式会社 Oxalis Chemicals Ltd.
|
〒135-0091東京都港区台場2丁目3番2号 3-2, Daiba 2-chome Minato-ku Tokyo Japan
|
|
127
|
株式会社オハラ OHARA Inc.
|
〒252-5286神奈川県相模原市中央区小山1-15-30 15-30, Oyama 1-Chome, Chuo-ku, Sagamihara-shi,Kanagawa, 252-5286
|
|
128
|
小原化工株式会社 OHARA&CO.,LTD.
|
〒103-8352東京都中央区日本橋小舟町3-8 3-8,KOBUNA-CHO,NIHONBASHI,CHUO-KU,TOKYO,103-8352,JAPAN
|
|
129
|
オムロン株式会社 Omron Corp.
|
〒600-8530京都市下京区塩小路道堀川東入 Shiokoji Horikawa, Shimogyo-Ku, Kyoto, 600-8530Japan
|
|
130
|
オムロンソーシアル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OMRON SOCIAL SOLUTIONS CO., LTD.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2-3-13 品川フロントビル7階 SHINAGAWA FRONT BUILDING 7F 2-3-13, KONAN,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131
|
オリックス・レンテック株式会社 ORIX Rentec Corp.
|
〒141-0001東京都品川区北品川五丁目5番15号 大崎ブライトコア 5-5-15, Kita-Shinagawa, Shinagawa-ku, Tokyo, 141-0001
|
|
132
|
オリンパス株式会社 Olympus Corporation
|
〒192-8507東京都八王子市石川町2951番地 2951Ishikawa-machi, Hachioji-shi, Tokyo 192-8507,Japan
|
|
133
|
オルガノ株式会社 ORGANO Corp.
|
〒東京都江東区新砂1丁目2番8号 1-2-8 Shinsuna, Koto-ku, Tokyo
|
|
134
|
オン・セミコンダクタ・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ON Semiconductor Japan Holdings Ltd.
|
〒370-0596群馬県邑楽郡大泉町坂田1丁目1番1号 1-1-1, Sakata, Oizumi-machi, Ora-gun, Gunma 370-0596 Japan
|
|
135
|
株式会社カイジョー Kaijo Corp.
|
〒東京都羽村市栄町3-1-5 3-1-5, Sakae-cho, Hamura, Tokyo
|
|
136
|
国立研究開発法人 海洋研究開発機構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and Technology (JAMSTEC)
|
〒237-0061神奈川県横須賀市夏島町2番地15 2-15 Natsushima-cho, Yokosuka, Kanagawa, 237-0061 Japan
|
|
137
|
花王株式会社 Kao Corp.
|
〒東京都中央区日本橋茅場町1-14-10 14-10, Nihonbashi Kayabacho 1-chome Chuo-ku,Tokyo
|
|
138
|
加賀電子株式会社 KAGA ELECTRONICS CO.,LTD.
|
〒101-8629東京都千代田区神田松永町20番地 20 Kandamatsunagacyo,Chiyoda-ku Tokyo 101-8629Japan
|
|
139
|
カシオ計算機株式会社 CASIO COMPUTER CO.,LTD.
|
〒151-8543東京都渋谷区本町1-6-2 6-2,Hon-machi 1chome,Shibuya-ku,Tokyo,151-8543,Japan
|
|
140
|
兼松株式会社 Kanematsu Corp.
|
〒105-8005東京都港区芝浦1-2-1 シーバンスN館 2-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8005Japan
|
|
141
|
株式会社兼松KGK Kanematasu KGK Corp.
|
〒176-8510東京都練馬区桜台一丁目1番6号 1-1-6 Sakuradai, Nerima-ku, Tokyo 176-8510, Japan
|
|
142
|
東光株式会社 TOKO, Inc.
|
〒350-2281埼玉県鶴ヶ島市大字五味ヶ谷18 18, Oaza Gomigatani Tsurugashima-shi, Saitama,350-228, Japan
|
|
143
|
川崎重工業株式会社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神戸市中央区東川崎町3-1-1
|
|
144
|
株式会社神崎高級工機製作所 KANZAKI KOKYUKOKI MFG CO., LTD
|
〒661-0981兵庫県尼崎市猪名寺2丁目18番1号 2-18-1 Inadera, Amagasaki, Hyogo 661-0981, Japan
|
|
145
|
キーサイト・テクノロジー合同会社 Keysight Technologies Japan G.K.
|
〒192-8550東京都八王子市高倉町9-1 9-1,Takakura-Cho,Hachioji-shi,Tokyo,192-8550 Japan
|
|
146
|
ギガフォトン株式会社 GIGAPHOTON INC.
|
〒323-8558栃木県小山市横倉新田400 400 Yokokurashinden, Oyama-shi, Tochigi-ken 323-8558,Japan
|
|
147
|
KISCO株式会社 KISCO LTD.
|
〒541-8513大阪府大阪市中央区伏見町3-3-7 3-3-7 FUSHIMI-MACHI CHUO-KU OSAKA 541-8513JAPAN
|
|
148
|
キタムラ機械株式会社 KITAMURA MACHINERY CO.,LTD.
|
〒939-1192富山県高岡市戸出町1870番地 1870 Toide,Takaoka,Toyama 939-1192,Japan
|
|
149
|
株式会社 北村製作所 Kitamura Machine Works Co.,Ltd.
|
〒130-0012東京都墨田区太平4-13-4 4-13-4,Taihei Sumida-Ku,Tokyo 130-0012
|
|
150
|
キヤノン株式会社 Canon Inc.
|
〒東京都大田区下丸子3-30-2 30-2, Shimomaruko 3-chome, Ohta-ku, Tokyo 146-8501, Japan
|
|
151
|
キヤノンアネルバ株式会社 Canon ANELVA Corp.
|
〒215-8550神奈川県川崎市麻生区栗木2-5-1 2-5-1, Kuriki, Aso-ku, Kawasaki-shi, Kanagawa 215-8550, Japan
|
|
152
|
キヤノン電子株式会社 CANON ELECTRONICS Inc.
|
〒369-1892埼玉県秩父市下影森1248番地 1248 Shimokagemori, Chichibu-shi, Saitama 369-1892,Japan
|
|
153
|
キヤノンファインテックニスカ株式会社 CANON FINETECH NISCA INC.
|
〒341-8527埼玉県三郷市中央1丁目14番地1 14-1, CHUO 1-CHOME, MISATO-SHI, SAITAMA 341-8527, JAPAN
|
|
154
|
キヤノンマシナリー株式会社 Canon Machinery lnc.
|
〒滋賀県草津市南山田町字縄手崎85 85 Minami-Yamadacho, Kusatsu-Shi, Shiga 525-8511,Japan
|
|
155
|
キャノンメディカルシステムズ株式会社 Canon Medical Systems Corp.
|
〒324-8550栃木県大田原市下石上1385 1385, Shimoishigami, Otawara-Shi, Tochigi 324-8550,Japan
|
|
156
|
協栄産業株式会社 Kyoei Sangyo CO., LTD.
|
〒150-8585東京都渋谷区松濤2-20-4 20-4, Shoto2-chome, Shibuya-ku, Tokyo
|
|
157
|
共栄商事株式会社 Kyoei Shoji CO., LTD.
|
〒100-0006東京都千代田区有楽町1-7-1 有楽町電気ビル北館13F Yurakucho Denki North Building 13F Yurakucho 1-7-1Chiyoda-ku Tokyo 100-0006 Japan
|
|
158
|
株式会社 京三製作所 Kyosan Electric Manufacturing Co.,Ltd.
|
〒230-0031神奈川県横浜市鶴見区平安町二丁目29番地の1 29-1,2-chome,Heian-cho,Tsurumi-ku,Yokohama City,230-0031 Japan
|
|
159
|
京セラ株式会社 Kyocera Corp.
|
〒京都市伏見区竹田鳥羽殿町6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 Kyoto 612-8501Japan
|
|
160
|
京セラドキュメント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KYOCERA Document Solutions Inc.
|
〒540-8585大阪府大阪市中央区玉造1-2-28 1-2-28 Tamatsukuri, Chuo-ku, Osaka 540-8585, Japan
|
|
161
|
共同印刷株式会社 Kyodo printing CO., LTD.
|
〒112-8501東京都文京区小石川4-14-12 4-14-12 Koishikawa, Bunkyo-ku, Tokyo 112-8501
|
|
162
|
株式会社 共和電業 Kyowa Electronic Instruments Co.,Ltd
|
〒182-8520東京都調布市調布ヶ丘3-5-1 3-5-1, Chofugaoka, Chofu, Tokyo 182-8520 Japan
|
|
163
|
極東貿易株式会社 KYOKUTO BOEKI KAISHA, LTD.
|
〒100-0004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 2丁目2番1号 (新大手町ビル7階) 7th Floor, New Otemachi Building, 2-1, Otema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0004, Japan
|
|
164
|
株式会社キリウテクノ KIRIU TECHNO COPORATION
|
〒群馬県伊勢崎市三室町5842番地 5842, Mimuro-Cho, Isesaki-Shi, Gunma, Japan
|
|
165
|
金属技研株式会社 Metal Technology Co.Ltd.
|
〒164-8721東京都中野区本町1-32-2 ハーモニータワー27階 Harmony Tower 27F,1-32-2 Honcho,Nakano-Ku,Tokyo,164-8721,JAPAN
|
|
166
|
株式会社近鉄エクスプレス販売 Kintetsu World Express Sales, Inc.
|
〒108-0073東京都港区三田2丁目7番13号 2-7-13 Mita, Minato-ku, Tokyo 108-0073 Japan
|
|
167
|
クアーズテック株式会社 CoorsTek KK
|
〒141-0032東京都品川区大崎2-11-1 11-1 Osaki 2-chome, Shinagawa-ku, Tokyo 141-0032,Japan
|
|
168
|
クオリティソフト株式会社 QualitySoft Corporation
|
〒102-0083東京都千代田区麹町三丁目3番地4 KDX 麹町ビル 3-3-4 Kojimachi, Chiyoda-ku, Tokyo 102-0083 Japan
|
|
169
|
株式会社クボタ Kubota Corporation
|
〒556-8601大阪市浪速区敷津東一丁目2番47号 2-47, Shikitsuhigashi 1-chome, Naniwa-ku, Osaka,556-8601 Japan
|
|
170
|
グラフテック株式会社 GRAPHTEC Corp.
|
〒244-8503神奈川県横浜市戸塚区品濃町503番10号 503-10 Shinano-cho Totsuka-ku Yokohama 244-8503Japan
|
|
171
|
クラリオン株式会社 Clarion CO., LTD.
|
〒330-0081埼玉県さいたま市中央区新都心7番地2 7-2, Shintoshin, Chuo-Ku, Saitama-Shi, Saitama, 330-0081, Japan
|
|
172
|
株式会社クラレ KURARAY CO., LTD.
|
〒710-8622岡山県倉敷市酒津1621 1621 Sakazu Kurashiki, Okayama 710-8622, Japan
|
|
173
|
グリーンフィクス株式会社 GREEN FIX CO., LTD.
|
〒467-0047名古屋市瑞穂区日向町4-2 4-2 Hinata-Machi Mizuho-Ku Nagoya Japan
|
|
174
|
栗田工業株式会社 Kurita Water Industries LTD.
|
〒164-0001東京都中野区中野4丁目10番1号 Nakano Central Park East,10-1 Nakano 4-Chome,Nakano-ku, Tokyo Japan 164-0001
|
|
175
|
株式会社クレハ KUREHA CORPORATION
|
〒103-8552東京都中央区日本橋浜町3-3-2 3-3-2,Nihonbashi-Hamacho,Chuo-ku,Tokyo 103-8552,Japan
|
|
176
|
グローブライド株式会社 GLOBERIDE, Inc.
|
〒東京都東久留米市前沢3-14-16 3-14-16 Maesawa, Higashikurume-shi Tokyo 203-8511Japan
|
|
177
|
黒田電気株式会社 KURODA ELECTRIC Co.,Ltd.
|
〒140-0013東京都品川区南大井5-17-9 5-17-9 Minami-Ooi,Shinagawa-ku,Tokyo,JAPAN
|
|
178
|
ケイディーアイ株式会社 KDI CO., LTD.
|
〒105-0014東京都港区芝3-3-14 ニットクビル1階 1F, Nittoku-bldg., 3-14, 3-chome, Shiba, Minato-ku,Tokyo, Japan
|
|
179
|
ケーエスエス株式会社 KSS CO ., LTD
|
〒146-0093東京都大田区矢口1-22-14 1-22-14 Yaguchi,Ohta-ku,Tokyo 146-0093,Japan
|
|
180
|
株式会社KDDI総合研究所 KDDI Research, Inc
|
〒356-8502埼玉県ふじみ野市大原2-1-15 2-1-15 Ohara, Fujimino-shi, Saitama, 356-8502 Japan
|
|
181
|
株式会社ケーヒン Keihin Corp.
|
〒東京都新宿区西新宿1-26-2 新宿野村ビル39F Shinjuku Nomura Bldg., 39F, 1-26-2, Nishi Shinjuku,Shinjuku-ku, Tokyo, 163-0539, Japan
|
|
182
|
株式会社KELK KELK Ltd.
|
〒254-8543神奈川県平塚市四之宮3-25-1 3-25-1 Shinomiya, Hiratsuka-shi, Kanagawa-ken, 254-8543 Japan
|
|
183
|
小池酸素工業株式会社 Koike Sanso Kogyo Co., Ltd.
|
〒267-0056千葉県千葉市緑区大野台1-9-3 KOIKEテクノセンター KOIKE Techno Center 1-9-3, Onodai, Midori-ku,Chiba-shi, Chiba, 267-0056, JAPAN
|
|
184
|
光音電波株式会社 Ko-on Dempa CO., LTD.
|
〒180-0001東京都武蔵野市吉祥寺北町3丁目8番8号 8-8, Kitijouji Kitamati 3-chome Musashino, , Tokyo 180-0001, Japan
|
|
185
|
株式会社神戸製鋼所 Kobe Steel, LTD.
|
〒651-8585神戸市中央区脇浜海岸通二丁目2番4号 2-4, Wakinohama-Kaigandori 2-chome, Chuo-kuKobe, Hyogo, 651-8585, Japan
|
|
186
|
光洋機械工業株式会社 Koyo Machine Industries CO., LTD.
|
〒大阪市八尾市南植松2-34 2-23, Minami Uematsu-Cho, Yao-City, Osaka 581-0091, Japan
|
|
187
|
光洋サーモシステム株式会社 KOYO THERMO SYSTEMS CO., LTD.
|
〒632-0084奈良県天理市嘉幡町229番地 229, Kabata-cho, Tenri-shi, Nara 632-0084
|
|
188
|
光洋電子工業株式会社 KOYO ELECTRONICS INDUSTRIES CO., LTD.
|
〒187-0004東京都小平市天神町4-9-1 4-9-1 Tenjin-cho, Kodaira-shi,Tokyo, Japan
|
|
189
|
コーセル株式会社 COSEL CO., LTD.
|
〒930-0816富山市上赤江町1-6-43 1-6-43 Kamiakae-machi Toyama 930-0816 Japan
|
|
190
|
コーヨー光和株式会社 KOYO-KOWA CO.,LTD.
|
〒556-0017大阪市浪速区湊町2丁目1番7号 ルネッサ難波ビル6階 Runessa Namba Bldg. 6th Floor, 1-7, 2-chomeMinatomachi, Naniwa-ku, Osaka, 556-0017 Japan
|
|
191
|
株式会社国際電気セミコンダクターサービス Kokusai Electric Semiconductor ServiceInc.
|
〒939-2393富山県富山市八尾町保内2-1 2-1, Yasuuchi, Yatsuo-Machi, Toyama-Shi, Toyama,939-2393, Japan
|
|
192
|
コニカミノルタ株式会社 KONICA MINOLTA, INC.
|
〒100-7015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ー7ー2 2-7-2 Marunouhi, Chiyoda-ku Tokyo 100-7015, Japan
|
|
193
|
小西安株式会社 KONISHIYASU CO., LTD.
|
〒103-0023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2-6-3 6-3 Nihombashi honcho 2-chome, chuo-ku, Tokyo103-0023
|
|
194
|
コマツNTC株式会社 Komatsu NTC LTD.
|
〒939-1595富山県南砺市福野100番地 100 Fukuno, Nanto City, Toyama 939-1595, Japan
|
|
195
|
コマツクイック株式会社 Komatsu Used Equipment Corp.
|
〒221-0045神奈川県横浜市神奈川区神奈川2-16-15 イサワビル4F Kanagawa 2-16-15,Kanagawa-ku,Yokohamacity,Kanagawa Pref.
|
|
196
|
コマツ産機株式会社 Komatsu Industries Corp.
|
〒920-0225石川県金沢市大野町新町1番地1 1-1 Ono-machi-shinmachi,Kanazawa-shi,Ishikawa920-0225,Japan
|
|
197
|
株式会社小松製作所 Komatsu Ltd.
|
〒107-8414東京都港区赤坂二丁目3番6号 2-3-6,Akasaka,Minato-ku,Tokyo 107-8414,Japan
|
|
198
|
コマツ物流株式会社 Komatsu Logistics Corp.
|
〒221-8540神奈川県横浜市神奈川区金港町3-1 コンカード横浜8階 8F,Concurred Yokohama, 3-1, Kinkou-Cho,Kanagawa-ku Yokohama-City, Kanagawa 221-8540,Japan
|
|
199
|
株式会社コンテック CONTEC CO., LTD.
|
〒555-0025大阪府大阪市西淀川区姫里3-9-31 3-9-31, Himesato, Nishiyodogawa-ku, Osaka 555-0025, Japan
|
|
200
|
サーパス工業株式会社 SURPASS INDUSTRY CO., LTD.
|
〒埼玉県行田市下忍2203 2203 Shimooshi, Gyouda, Saitama, Japan
|
|
201
|
株式会社酒井商店 SAKAI SHOTEN CO.,LTD
|
〒959-1287新潟県燕市大関263 263 OSEKI TSUBAME-CITY,NIIGATA-PREF.959-1287JAPAN
|
|
202
|
サカタインクス株式会社 SAKATA INX CORP.
|
〒550-0002大阪府大阪市西区江戸堀1-23-37 1-23-37, Edobori, Nishi-ku, Osaka, 550-0002, Japan
|
|
203
|
サクサ株式会社 SAXA, Inc.
|
〒108-8050東京都港区白金1-17-3 NBFプラチナタワー NBF Platinum Tower 1-17-3, Shirokane Minato-ku,Tokyo 108-8050, Japan
|
|
204
|
佐藤商事株式会社 SATOSHOJI CORPORATION
|
〒100-8285東京都千代田丸の内1-8-1 丸の内トラストタワーN館16階 16F Marunouchi Trusut Tower North 1-8-1 Marunouchi,Chiyoda-ku, Tokyo 100-8285, Japan
|
|
205
|
佐鳥電機株式会社 SATORI ELECTRIC CO.,LTD
|
〒東京都港区芝1-14-10 1-14-10,SHIBA,MINATO-KU,TOKYO,JAPAN
|
|
206
|
三栄ハイテックス株式会社 Sanei Hytechs Co.,Ltd.
|
〒435-0015静岡県浜松市東区子安町311番地の3 Koyasu-choHigashi-Ku,Hamamatsu-shi,Shizuoka,435-0015,Japan
|
|
207
|
国立研究開発法人 産業技術総合研究所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Science and Technology
|
〒100-8921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3-1 3-1, Kasumigaseki 1-chome, Chiyodaku, Tokyo 100-8921 Japan
|
|
208
|
三京物産株式会社 SANKYO & CO.,LTD.
|
〒166-0011東京都杉並区梅里1-13-12 新高円寺第一生命ビル3F 3rd Fl.,Shin-Koenji Daiichi Seimei Bldg., 13-12 1-chome, Umezato, Suginami-ku, Tokyo 166-0011,Japan
|
|
209
|
三信電気株式会社 Sanshin Electronics CO., LTD.
|
〒108-8404東京都港区芝4-4-12 4-4-12, shiba, Minatoku, Tokyo, Japan
|
|
210
|
サンディスク株式会社 SanDisk Limited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1丁目6番31号品川東急ビル3F Shinagawa Tokyu Bldg. 3F, 1-6-31, Konan, Minato-ku,Tokyo, Japan
|
|
211
|
三洋電機株式会社 SANYO Electric CO., LTD.
|
〒574-8534大阪府大東市三洋町1番1号 1-1, Sanyo-cho, Daito Ciy, Osaka 574-8534, Japan
|
|
212
|
株式会社サンワード SUNWARD INTERNATIONAL Inc.
|
〒438-8501静岡県磐田市新貝2500 2500 Shingai, Iwata, Shizuoka 438-8501,Japan
|
|
213
|
GE ヘルスケア・ジャパン株式会社 GE Healthcare Japan Corp.
|
〒191-8503東京都日野市旭が丘4-7-127 4-7-127, Asahigaoka Hino-shi, Tokyo, Japan
|
|
214
|
株式会社GSIクレオス GSI Creos corporation
|
〒175-0094東京都千代田区九段南2-3-1 2-3-1,Kudan-minami,Chiyoda-ku,Tokyo 102-0074,Japan
|
|
215
|
シークス株式会社 SIIX Corp.
|
〒541-0051大阪市中央区備後町一丁目4番9号 シークスビル SIIX BLDG. 1-4-9, Bingo-machi, Chuo-ku, Osaka,Japan541-0051
|
|
216
|
株式会社JVCケンウッド JVC KENWOOD Corporation
|
〒221-0022神奈川県横浜市神奈川区守屋町三丁目12番地 3-12, Moriya-cho, Kanagawa-ku, Yokohama-shi,Kanagawa, 221-0022, Japan
|
|
217
|
JSR株式会社 JSR Corp.
|
〒105-8640東京都港区東新橋1-9-2 1-9-2 Higashishinbashi Minatoku, Tokyo, 105-8640Japan
|
|
218
|
JX金属株式会社 JX Nippon Mining & Metals
|
〒100-8164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一丁目1番2号 1-2 Otemachi 1-chome,Chiyouda-ku, Tokyo, 100-8164, Japan
|
|
219
|
JXTGエネルギー株式会社 JXTG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
|
〒100-8162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一丁目1番2号 1-2 Otema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162Japan
|
|
220
|
JNC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JNC Engineering Co. Ltd.
|
〒260-0015千葉市中央区富士見2丁目3番地1号 (塚本大千葉ビル) 2-3-1, Fujimi, Chuo-ku, Chiba City, 260-0015 Japan
|
|
221
|
JFE商事株式会社 JFE Shoji Trade Corp.
|
〒100-8070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1丁目9番5号 大手町フィナンシャルシティ・ノースタワー OTEMACHI FINANCIAL CITY North Tower 9-5,Otema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070,Japan
|
|
222
|
JFEスチール株式会社 JFE Steel Corpration
|
〒東京都千代田区内幸町2丁目2番地3号 2-3, Uchisaiwai-cho 2-chome, Chiyoda-ku, Tokyo,100-0011
|
|
223
|
株式会社ジェイテクト JTEKT Corp.
|
〒542-8502大阪府大阪市中央区南船場3-5-8 No.5-8, Minamisemba 3-chome, Chuo-ku, Osaka,Japan, 542-8502
|
|
224
|
株式会社システナ Systena Corporation
|
〒105-0022東京都港区海岸1丁目2番20号 Kaigan 1-2-20, Minato-ku, Tokyo,105-0022,Japan
|
|
225
|
シスメックス株式会社 SYSMEX CORPORATION
|
〒651-0073兵庫県神戸市中央区脇浜海岸通1丁目5番1号 1-5-1 Wakinohama-kaigandori,Chuo-ku,Kobe,Hyogo651-0073, Japan
|
|
226
|
シチズン時計株式会社 Citizen Watch Co., Ltd.
|
〒188-8511東京都西東京市田無町6-1-12 6-1-12, Tanashi-cho, Nishi-Tokyo-shi, Tokyo 188-8511,Japan
|
|
227
|
シチズンマシナリー株式会社 Citizen Machinary CO., LTD.
|
〒389-0206長野県北佐久郡御代田町御代田4107-6 4107-6 Miyota, Miyota-machi, Kitasaku-gun, Nagano-ken, 389-0206, Japan
|
|
228
|
芝浦エレテック株式会社 Shibaura Eletec Corp.
|
〒247-0006神奈川県横浜市栄区笠間2-5-1 2-5-1, Kasama, Sakae-Ku, Yokohama, 247-0006,Japan
|
|
229
|
芝浦メカトロニクス株式会社 Shibaura Mechatronics Corp.
|
〒247-8610神奈川県横浜市栄区笠間2-5-1 2-5-1, Kasama, Sakae-ku.Yokohama, 2470-8610,Japan
|
|
230
|
株式会社島精機製作所 SHIMA SEIKI MFG., LTD.
|
〒和歌山県和歌山市坂田85番 85 SAKATA WAKAYAMA Japan
|
|
231
|
島田理化工業株式会社 SPC ELECTRONICS CORPORATION
|
〒182-8602東京都調布市柴崎2-1-3 2-1-3, SHIBASAKI, CHOFU-SHI, TOKYO, 182-8602 Japan
|
|
232
|
株式会社島津製作所 Shimadzu Corp.
|
〒京都府京都市中京区西ノ京桑原町1 Kuwabaracho 1, Nishinokyo, Nakagyo-ku, Kyoto 604-8511
|
|
233
|
シャープ株式会社 Sharp Corporation
|
〒590-8522大阪府堺市堺区匠町1番地 1 Takumi-cho, Sakai-Ku, Sakai City, Osaka 590-8522,Japan
|
|
234
|
ジヤトコ株式会社 JATCO Ltd
|
〒417-8585静岡県富士市今泉700-1 700-1, Imaizumi, Fuji City, Shizuoka, JAPAN
|
|
235
|
株式会社ジャパンセミコンダクター JAPAN SEMICONDUCTOR CORPORATION
|
〒024-8510岩手県北上市北工業団地6番6号 6-6,Kita Kogyo-Danchi,Kitakami-City, Iwate,024-8510,Japan
|
|
236
|
株式会社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 Japan Display Inc.
|
〒105-0003東京都港区西新橋三丁目7番1号 ランディック第2新橋ビル Landic 2nd Bdg., 3-7-1 Nishi-shinbashi Minato-ku,Tokyo 105-0003, Japan
|
|
237
|
株式会社潤工社 Junkosha Inc.
|
〒309-1603茨城県笠間市福田961-20 961-20 Fukuda, Kasama-shi, Ibaraki-ken 309-1603Japan
|
|
238
|
昭和オプトロニクス株式会社 Showa Optronics CO., LTD.
|
〒東京都世田谷区新町3-5-3 5-3, 3-cho-me, Shinmachi, Setagaya-ku, Tokyo, 154-8506, Japan
|
|
239
|
株式会社昭和真空 Showa Shinku CO., LTD.
|
〒神奈川県相模原市田名3062-10 3062-10, Tana Sagamihara-shi, Kanagawa Pref.Japan
|
|
240
|
昭和電工株式会社 Showa Denko K.K.
|
〒105-8518東京都港区芝大門1-13-9 13-9, Shiba Daimon 1-Chome, Minato-ku, Tokyo 105-8518, Japan
|
|
241
|
昭和電線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SWCC SWOWA HOLDINGS CO.,LTD.
|
〒105-6013東京都港区虎ノ門四丁目3番1号(城山トラストタワー) Shiroyama Trust Tower,4-3-1 Toranomon,Minato-ku,Tokyo 105-6013 Japan
|
|
242
|
エヌイーシー ショット コンポーネンツ株式会社 NEC Schott Components Corp.
|
〒528-0034滋賀県甲賀市水口町日電3-1 3-1, Nichiden, Minakuchi-cho, Koka-shi, Shiga 528-0034, Japan
|
|
243
|
神栄株式会社 Shinyei Kaisha
|
〒兵庫県神戸市中央区京町77-1 77-1, Kyomachi, Chuo-ku, Kobe, 651-0178 Japan
|
|
244
|
信越石英株式会社 Shin-Etsu Quartz Products Co., Ltd.
|
〒160-0023東京都新宿区西新宿1-22-2 新宿サンエービル 1-22-2,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0-0023,Japan
|
|
245
|
信越ポリマー株式会社 ShinEtsu Polymer CO., LTD.
|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須田町1-9 1-9 Kanda-Sudacho,Chiyodaku,Tokyo 101-0041Japan
|
|
246
|
株式会社新川 SHINKAWA LTD.
|
〒東京都武蔵村山市伊奈平2丁目51番1号 2-51-1, INADAIRA, MUSASHIMURAYAMA-SHI, TOKYO,Japan
|
|
247
|
新川電機株式会社 Shinkawa Electric CO., LTD.
|
〒730-0029広島県広島市中区三川町10-9 Mikawa-cho 10-9, Nara-ku, Hiroshima-shi, Hiroshima,730-0029Japan
|
|
248
|
株式会社神鋼環境ソリューション Kobelco Eco-Solutions Co, .LTD.
|
〒651-0072神戸市中央区脇浜町1-4-78 4-78, 1-chome, Wakinohama-cho, Chuo-ku, Kobe,651-0072, Japan
|
|
249
|
神鋼商事株式会社 SHINSHO Corp.
|
〒541-8557大阪市中央区北浜2丁目6番地18号 6-18, Kitahama 2-Chome, Chuo-ku, Osaka, Japan
|
|
250
|
新光商事株式会社 Shinko Shoji CO., LTD.
|
〒東京都品川区大崎1-2-2 1-2-2 Osaki, Shinagawa-ku, Tokyo 141-8540, Japan
|
|
251
|
株式会社新興製作所 SHINKO Manufacturing Co.,Ltd
|
〒534-0016大阪府大阪市都島区友渕町3丁目4−22-208 3-4-22-208 Tomobuchi-Cho, Miyakojima-Ku, Osaka-Shi, Osaka534-0016 Japan
|
|
252
|
新光電気工業株式会社 Shinko Electric Industries CO., LTD.
|
〒381-2287長野県長野市小島田町80 80 Oshimada-Machi, Nagano-Shi, 381-2287 Japan
|
|
253
|
新生交易株式会社 SHINSEI KOEKI CO., LTD.
|
〒104-0033東京都中央区新川1-2-10 新川むさしやビル6階 SHINKAWA MUSASHIYA BLDG. 6F No. 2-10, SHINKAWA1-CHOME, CHUO-KU, TOKYO, JAPAN
|
|
254
|
新東亜交易株式会社 Shintoa Corporation
|
〒100-8383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6-1 6-1,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
|
255
|
新日本工機株式会社 SHIN NIPPON KOKI CO.,
|
〒590ー0157大阪市堺市南区高尾2丁500番地1 500-1, Takao 2ーCho, Minami-ku, Sakai, Osaka
|
|
256
|
新日本無線株式会社 New Japan Radio CO., LTD.
|
〒東京都中央区日本橋横山町3番地10号 3-10, Nihonbashi Yokoyama-cho, Chuo-ku, Tokyo
|
|
257
|
シンフォニア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SINFONIA TECHNOLOGY CO., LTD.
|
〒105-8564東京都港区芝大門1-1-30 芝NBFタワー Shiba NBF Tower, 1-30, Shiba-daimon 1-chome,Minato-ku, Tokyo, 105-8564, Japan
|
|
258
|
水ing株式会社 Swing Corporation
|
〒108-8470東京都港区港南1-7-18 7-18 Konan 1-chome,Minato-ku, Tokyo 108-8470,Japan.
|
|
259
|
株式会社 スギノマシン Sugino Machine Limited
|
〒937-8511富山県魚津市本江2410番地 2410 Hongo, Uozu-City, Toyama 937-8511 JAPAN
|
|
260
|
株式会社SCREEN PE 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PE Solutions Co., Ltd.
|
〒602-8585京都市上教区堀川通寺之内上る4丁目天神北町1番地の1 Tenjinkita-machi 1-1,Teranouchi-agaru 4-chome,Horikawa-dori,Kamigyo-ku,Kyoto,602-8585-Japan
|
|
261
|
株式会社SCREENグラフィック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Graphic Solutions Co., Ltd.
|
〒602-8585京都市上京区堀川通寺之内上る4丁目天神北町1番地の1 Tenjinkita-machi 1-1,Teranouchi-agaru 4-chome,Horikawa-dori,Kamigyo-ku,Kyoto,602-8585Japan
|
|
262
|
株式会社SCREENセミコンダクター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Semiconductor Solutions Co.,Ltd.
|
〒602-8585京都市上京区堀川通寺之内上る四丁目天神北町1番地の1 Tenjinkita-machi 1-1, Teranouchi-agaru 4-chome,Kamigyo-ku, Kyoto, 602-8585 Japan
|
|
263
|
株式会社SCREENファインテックソリューションズ SCREEN Finetech Solutions Co., Ltd.
|
〒602-8585京都市上京区堀川通寺之内上る四丁目天神北町1番地の1 Tenjinkita-machi 1-1, Teranouchi-agaru 4-chome,Horikawa-dori, Kamigyo-ku, Kyoto 602-8585 JAPAN
|
|
264
|
株式会社SCREENホールディングス SCREEN Holdings Co., Ltd.
|
〒602-8585京都市上京区堀川通寺之内上る4丁目天神北町1番地の1 Tenjinkita-machi 1-1, Teranouchi-agaru 4-chome,Horikawa-dori, Kamigyo-ku, Kyoto 602-8585, Japan
|
|
265
|
スズキ株式会社 Suzuki Motor Corp.
|
〒静岡県浜松市南区高塚町300番地 300 Takatsuka-cho, Minami-ku,Hamamatsu-shi,Shizuoka-ken
|
|
266
|
スター精密株式会社 Star Micronics Co., Ltd.
|
〒422-8654静岡県静岡市駿河区中吉田 20-10 20-10, Nakayoshida, Suruga-ku Shizuoka 422-8654,Japan
|
|
267
|
スタンレー電気株式会社 STANLEY ELECTRIC CO.,LTD.
|
〒153-8636東京都目黒区中目黒2-9-13 2-9-13 Nakameguro,Meguro-Ku,Tokyo 153-8636Japan
|
|
268
|
株式会社SUBARU SUBARU Corporation
|
〒150-8554東京都渋谷区恵比寿1-20-8 エビススバルビル Ebisu Subaru Bldg. 1-20-8,Ebisu, Shibuya-ku, Tokyo150-8554, Japan
|
|
269
|
住化ケムテックス株式会社 SUMICA CHEMTEX Co., LTD.
|
〒541-0041大阪市中央区北浜二丁目2番22号北浜中央ビル3階 2-2-22, KItahama, Chuo-ku, Osaka 541-0041
|
|
270
|
住商機電貿易株式会社 SUMISHO MACHINERY TRADECORPORATION
|
〒100-0003東京都千代田区一ツ橋一丁目2番2号 1-2-2, Hitotsubashi, Chiyoda-ku, Tokyo 100-0003,Japan
|
|
271
|
住友化学株式会社 Sumitomo Chemical CO., LTD.
|
〒104-8260東京都中央区新川二丁目27番1号 27-1, Shinkawa 2-chome, Chuo-ku, Tokyo 104-8260,Japan
|
|
272
|
住友金属鉱山株式会社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
〒東京都港区新橋5丁目11番3号 11-3 Shimbashi 5-chome, Minato-ku, Tokyo, Japan
|
|
273
|
住友重機械工業株式会社 Sumitomo Heavy Industries, LTD.
|
〒東京都品川区大崎2丁目1番1号 1-1, OSAKI 2-CHOME SHINAGAWAKU, TOKYO Japan
|
|
274
|
住友商事株式会社 SUMITOMO CORPORATION
|
〒100-8601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二丁目3番2号 3-2, Ootema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8601 Japan
|
|
275
|
住友商事ケミカル株式会社 SUMITOMO SHOJI CHEMICALS CO., LTD.
|
〒100-0003東京都千代田区一ツ橋一丁目2番2号 2-2, HITOTSUBASHI 1-CHOME, CHIYODA-KU TOKYO,100-0003 Japan
|
|
276
|
住友商事マシネックス株式会社 Sumitomo Shoji Machinex Co., Ltd.
|
〒100-0003東京都千代田区一ツ橋1丁目2番2号 1-2-2, Hitotsubashi, Chiyoda-ku, Tokyo
|
|
277
|
住友精化株式会社 Sumitomo Seika Chemicals CO., LTD.
|
〒541-0041大阪府大阪市中央区北浜4-5-33 4-5-33 Kitahama, Chuo-ku, Osaka 541-0041, Japan
|
|
278
|
住友電気工業株式会社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
〒541-0041大阪市中央区北浜4-5-33 5-33, Kitahama 4-Chome, Chuo-ku, Osaka, 541-0041Japan
|
|
279
|
住友電工デバイス・イノベーション株式会社 SUMITOMO ELECTRIC DEVICEINNOVATIONS, Inc.
|
〒244-0845神奈川県横浜市栄区金井町1番地 1, kanai-cho, Sakae-ku, Yokohama, Kanagawa 244-0845 Japan
|
|
280
|
住友ベークライト株式会社 Sumitomo Bakelite Co., Ltd.
|
〒140-0002東京都品川区東品川二丁目5番8号 5-8 Higashi-Shinagawa 2-chome, Shinagawa-ku,Tokyo, Japan
|
|
281
|
セイコーインスツル株式会社 Seiko Instruments Inc.
|
〒千葉県千葉市美浜区中瀬1-8 8, Nakase 1-chome, Mihama-ku, Chiba-shi, Chiba261-8507, Japan
|
|
282
|
セイコーエプソン株式会社 SEIKO EPSON Corp.
|
〒163-0811東京都新宿区西新宿2-4-1 新宿NSビル 11F Shinjuku NS Bldg. 2-4-1 Nishishinjuku, Shinjuku-ku,Tokyo 163-0811 Japan
|
|
283
|
セザス・ジャパン株式会社 CEZUS JAPAN K.K
|
〒107-0052東京都港区赤坂2丁目21番3号レドンドビル2階 Redondo Bldg. 2F, 2-21-3 Akasaka, Minato-ku, Tokyo,107-0052, Japan
|
|
284
|
株式会社セツヨーアステック SETSUYO ASTEC Corp.
|
〒530-0054大阪市北区南森町2丁目1番29号 2-1-29 Minamimorimachi, Kita-ku, OSAKA
|
|
285
|
セルマーク・ジャパン株式会社 CellMark Japan
|
〒163-1307東京都新宿区西新宿6-5-1 新宿アイランドタワー7階 7F, Shinjuku i-LAND Tower, 6-5-1 Nishi-Shinjuku,Shinjuku-ku, Tokyo 163-1307, Japan
|
|
286
|
千住金属工業株式会社 SENJU METAL INDUSTRY CO.,LTD.
|
〒120-8555東京都足立区千住橋戸町23番地 23 Senju Hashido-Cho Adachi-ku Tokyo, 120-8555
|
|
287
|
双日株式会社 Sojitz Corp.
|
〒100-8691東京都千代田区内幸町2-1-1 1-1, Uchisaiwaicho 2-chome,Chiyoda-ku,Tokyo 100-8691,Japan
|
|
288
|
双日エアロスペース株式会社 Sojitz Aerospace Corp.
|
〒107-8518東京都港区赤坂2-17-22 17-22, Akasaka 2-chome, Minato-ku, Tokyo 107-8518
|
|
289
|
双日ジェクト株式会社 Sojitz JECT Corp.
|
〒105-0003東京都港区西新橋2-8-6 11F, Sumitomo Fudosan-Hibiya Bldg, 8-6, Nishi-shimbashi, Minato-ku, Tokyo 105-0003, Japan
|
|
290
|
双日プラネット株式会社 Sojitz Pla-Net Corporation
|
〒540-8689大阪市大阪市中央区久太郎町1丁目6番29号 6-29,Kyutaro-machi 1-chome,Chuo-ku,Osaka,540-8689,Japan
|
|
291
|
双日マシナリー株式会社 Sojitz Machinery Corporation
|
〒100-0005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一丁目6番1号 6-1,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
|
292
|
株式会社ソディック Sodick CO., LTD.
|
〒224-8522神奈川県横浜市都筑区仲町台3-12-1 3-12-1 Nakamachidai, Tsuzuki-ku, Yokohama,Kanagawa, 224-8522 Japan
|
|
293
|
ソニー株式会社 Sony Corp.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一丁目7番1号 1-7-1 Konan,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294
|
ソニーグローバル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オペレーションズ株式会社 Sony Global Manufacturing & OperationsCorporation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一丁目7番1号 1-7-1 Konan,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295
|
株式会社ソニー・インタラクティブエンタテイメント Sony Interactive Computer EntertainmentInc.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一丁目7番1号 1-7-1 Konan, 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296
|
ソニーセミコンダクタマニュファクチュアリング株式会社 Sony Semiconductor ManufacturingCorporation
|
〒869-1102熊本県菊池郡菊陽町原水4000番地の1 4000-1 Haramizu, Kikuyo-machi, Kikuchi-gun,Kumamoto 869-1102, Japan
|
|
297
|
ソニーモバイ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 Sony Mobile Communications Japan, Inc.
|
〒140-0002東京都品川区東品川4-12-3 4-12-3 Higashisinagawa, Shinagawa-ku, Tokyo 140-0002, Japan
|
|
298
|
第一実業株式会社 DAIICHI JITUSGYO CO.,LTD.
|
〒101-8222東京都千代田区神田駿河台四丁目6番地 4-6 KANDASURUGADAI, CHIYODA-KU, TOKYO 101-8222 JAPAN
|
|
299
|
ダイキン工業株式会社 Daikin Industries, LTD.
|
〒530-8323大阪市北区中崎西2-4-12 梅田センタービル Umeda Center Bldg., 2-4-12, Nakazaki-Nishi Kita-Ku,Osaka, 530-8323, Japan
|
|
300
|
株式会社大真空 DAISHINKU CORP.,
|
〒兵庫県加古川市平岡町新在家1389番地 1389 Shinzaike, Hiraoka-cho, Kakogawa, Hyogo
|
|
301
|
株式会社ダイセル Daicel Corporation
|
〒530-0011大阪府大阪市北区大深町3番1号 3-1, Ofuka-cho, Kita-ku, Osaka 530-0011, Japan
|
|
302
|
ダイセン・メンブレン・システムズ株式会社 DAICEN MEMBRANE-SYSTEMS Ltd.
|
〒108-8230東京都港区港南二丁目18番1号 JR 品川イーストビル14階 JR Shinagawa East Building 14F 2-18-1, KounanShinagawa-ku Tokyo 108-8230
|
|
303
|
株式会社ダイチューテクノロジーズ Daichu Technologies CO., LTD.
|
〒348-8555埼玉県羽生市弥勒704-4 704-4, Miroku, Hanyuu-city, Saitama 348-8555, Japan
|
|
304
|
Dynabook株式会社 Dynabook Inc.
|
〒135-8505東京都江東区豊洲5-6-15 NBF豊洲ガーデンフロント Toyosu Garden Front 6-15, Toyosu 5-chome, Koto-ku,Tokyo 135-8505, Japan
|
|
305
|
大日本印刷株式会社 Dai Nippon Printing CO., LTD.
|
〒東京都新宿区市谷加賀町一丁目1番1号 1-1-1, Ichigaya-Kagacho, Shinjyuku-ku, Tokyo, Japan
|
|
306
|
大八化学工業株式会社 DAIHACHI CHEMICAL INDUSTRY CO., LTD.
|
〒541-0046大阪市中央区平野町1-8-13 平野町八千代ビル HIRANOMACHI YACHIO BLDG. 8-13, HIRANOMACHI 1-CHOME, CHUO-KU, OSAKA 541-0046 Japan
|
|
307
|
ダイハツ工業株式会社 Daihatsu Mortor CO., LTD.
|
〒563-8651大阪府池田市ダイハツ町1-1 1-1, Daihatsu-cho, Ikeda-city, Osaka 563-8651, Japan
|
|
308
|
株式会社ダイフク DAIFUKU CO., LTD.
|
〒555-0012大阪市西淀川区御幣島3-2-11 3-2-11 Mitejima, Nishiyodogawa-ku, Osaka 555-0012,Japan
|
|
309
|
株式会社ダイヘン DAIHEN Corp.
|
〒大阪市淀川区田川2丁目1番11号 1-11, 2-CHOME, TAGAWA YODOGAWA-KU OSAKA,532-8512, Japan
|
|
310
|
太洋物産株式会社 TAIYO BUSSAN CO.,LTD
|
〒650-0012兵庫県神戸市中央区北長狭通5-5-10 NO.5-10 KITANAGASA-DORI 5-CHOME CHUO-KUKOBE,JAPAN
|
|
311
|
太陽誘電株式会社 Taiyo Yuden CO., LTD.
|
〒104-0031東京都中央区京橋2-7-19 2-7-19, Kyobashi, Chuo-ku, Tokyo 104-0031 Japan
|
|
312
|
田岡化学工業株式会社 Taoka Chemical CO., LTD.
|
〒532-0006大阪市淀川区西三国4-2-11 2-11, 4-chome, Nishimikuni, Yodogawa-ku, Osaka532-0006, Japan
|
|
313
|
株式会社タカギセイコー TAKAGI SEIKO CORPORATION
|
〒933-8628富山県高岡市二塚322番地の3 322-2 Futazuka,Takaoka,Toyama 933-8628 Japan
|
|
314
|
株式会社高砂製作所 TAKASAGO, LTD.
|
〒213-8558川崎市高津区溝口1-24-16 1-24-16 Mizonokuchi Takatsu-Ku Kawasaki City 213-8558 Japan
|
|
315
|
高松機械工業株式会社 Takamatsu Machinery CO., LTD.
|
〒石川県白山市旭丘1-8 1-8, Asahigaoka Hakusan Ishikawa
|
|
316
|
株式会社滝澤鉄工所 TAKISAWA MACHINE TOOL CO., LTD.
|
〒701-0164岡山県岡山市撫川983 983 Natsukawa Okayama 701-0164 Japan
|
|
317
|
タナカ・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Tanaka Corporation
|
〒802-0001福岡県北九州市小倉北区浅野3丁目8番1号 3-8-1, Asano, Kokurakita-Ku, Kitakyushu-Shi,Fukuoka-Ken, 802-0001 JAPAN
|
|
318
|
多摩化学工業株式会社 Tama Chemicals Co.,Ltd
|
〒210-0005神奈川県川崎市川崎区東田町6番地1 6-1 Higashidacho, Kawasaki-ku, Kawasaki City,Kanagawa 210-0005, Japan
|
|
319
|
株式会社チノー CHINO Corp.
|
〒173-8632東京都板橋区熊野町32番8号 32-8 KUMANO-CHO ITABASHI-KU, TOKYO, Japan
|
|
320
|
蝶理株式会社 Chori CO., LTD.
|
〒103-8652東京都中央区日本橋堀留町2-4-3 4-3, Horidomecho 2-chme, Nihonbashi, Chuo-ku,Tokyo103-8652, Japan
|
|
321
|
千代田化工建設株式会社 Chiyoda Corporation
|
〒220-8765横浜市西区みなとみらい4丁目6番2号 みなとみらいグランドセントラルタワー Minatomirai Grand Central Tower4-6-2, Minatomirai, Nishi-ku, Yokohama 220-8765,Japan
|
|
322
|
千代田興業株式会社 CHIYODA KOGYO CO., LTD.
|
〒530-0001大阪府大阪市北区梅田2-4-9 ブリーゼタワー Breeze Tower 4-9 Umeda 2-chome, Kita-ku, Osaka530-0001 Japan
|
|
323
|
株式会社ツガミ Tsugami Corp.
|
〒103-0006東京都中央区日本橋富沢町 12-20 12-20, Tomizawa-cho, Nihonbashi, Chuou-ku, Tokyo,Japan
|
|
324
|
月電ソフトウェア株式会社 TSUKIDEN SOFTWARE CO., LTD.
|
〒福島県福島市太平寺字沖高68番地 68 Okidaka, Taiheiji, Fukushima City, Fukushima Pref,Japan
|
|
325
|
株式会社ディーアンドエムホールディングス D&M Holdings Inc.
|
〒神奈川県川崎市川崎区日進町2-1 D&Mビル D&M Building, 2-1 Nisshin-cho, Kawasaki-ku,Kawasaki-shi, Kanagawa, 210-8569, Japan
|
|
326
|
株式会社ティーエムケー TMK Corporation.
|
〒252-0301神奈川県相模原市南区鵜野森一丁目30番2号804 1-30-2-804 Unomori, Minami-Ku, Sagamihara-Shi,Kanagawa, Japan
|
|
327
|
TOA株式会社 TOA Corporation
|
〒650-0046兵庫県神戸市中央区港島中町7-2-1 7-2-1 Minatojima-Nakamachi, Chuo-ku, Kobe, Hyogo650-0046, Japan
|
|
328
|
TDK株式会社 TDK Corporation
|
〒108-0023東京都港区芝浦3-9-1 3-9-1, Shibaura, Minato-ku, Tokyo, 108-0023 Japan
|
|
329
|
TDKラムダ株式会社 TDK-Lambda Corporation
|
〒103-6128東京都中央区日本橋2-5-1 2-5-1, Nihonbashi,Chuo-ku, Tokyo 103-6128,Japan
|
|
330
|
THK株式会社 THK CO., LTD.
|
〒東京都品川区西五反田3-11-6 3-11-6 Nishigotanda Shinagawa-ku Tokyo Japan
|
|
331
|
DMG森精機株式会社 DMG MORI CO., LTD
|
〒639-1160奈良県大和郡山市北郡山町106 106 Kita-koriyama-cho, Yamato-Koriyama City, Nara639-1160, Japan
|
|
332
|
帝人株式会社 TEIJIN LIMITED
|
〒530-8605大阪府大阪市北区中之島3-2-4 2-4, Nakanoshima 3-chome, Kita-ku, Osaka 530-8605,Japan
|
|
333
|
帝人フロンティア株式会社 TEIJIN FRONTIER CO.,LTD.
|
〒530-8605大阪府大阪市北区中之島3丁目2番4号 2-4, Nakanoshima 3-Chome, kitao-ku, Osaka 530-8605 Japan
|
|
334
|
株式会社ディスコ DISCO Corp.
|
〒143-8580東京都大田区大森北2-13-11 13-11 Omori-Kita 2-chome Ota-ku Tokyo 143-8580Japan
|
|
335
|
テクノクオーツ株式会社 TECHNO QUARTZ Inc.
|
〒164-0012東京都中野区本町1-32-2 ハーモニータワー12F Harmony Tower 12F 32-2 Honcho,1-chome,Nakano-ku, Tokyo 164-0012 Japan
|
|
336
|
テラダイン株式会社 Teradyne K..K.
|
〒220-0012神奈川県横浜市西区みなとみらい三丁目6番3号 3-6-3, Minato Mirai, Nishi-ku, Yokohama Kanagawa220-0012 Japan,
|
|
337
|
株式会社デンソーテン DENSO TEN Limited
|
〒652-8510兵庫県神戸市兵庫区御所通1-2-28 2-28, Gosho-dori 1-chome, Hyogo-ku, Kobe, 652-8510 Japan
|
|
338
|
株式会社デンソー Denso Corp.
|
〒448-8661愛知県刈谷市昭和町1-1 1-1, Showa-Cho, Kariya-Shi Aichi-Ken, 448-8661 Japan
|
|
339
|
株式会社デンソーウェーブ DENSO WAVE INCORPORATED
|
〒470-2297愛知県知多郡阿久比町大字草木字芳池1番 1 Yoshiike Kusagi Agui-cho, Chita-gun, Aichi, 470-2297 Japan
|
|
340
|
東北パイオニアEG株式会社 TOHOKU PIONEER EG CORPORATION
|
〒994-0057山形県天童市石鳥居2-1-57 2-1-57ISHIDORII,TENDO,YAMAGATA994-0057,JAPAN
|
|
341
|
Tianma Japan株式会社 Tianma Japan Ltd.
|
〒212-0058神奈川県川崎市幸区鹿島田一丁目1番2号 1-1-2, Kashimada, Saiwai-ku, Kawasaki, Kanagawa212-0058
|
|
342
|
天龍コンポジット株式会社 TENRYU COMPOSITE CO., LTD.
|
〒509-0304岐阜県加茂郡川辺町中川辺1430番地1 1430-1 NAKAKAWABE KAWABE-CHO KAMO-GUNGIFU-PREF. Japan 509-0304
|
|
343
|
東亜ディーケーケー株式会社
|
〒169-8684東京都新宿区高田馬場1-29-10
|
|
344
|
東亜バルブ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TOA VALVE ENGINEERING INC.
|
〒660-0054兵庫県尼崎市西立花町5丁目12番1号 5-12-1, Nishitachibana-cho, Amagasaki-shi, Hyogo660-0054, Japan
|
|
345
|
東海高熱工業株式会社 TOKAI KONETSU KOGYO CO., LTD.
|
〒東京都台東区北上野1丁目10番14号 住友不動産ビル5号館 SUMITOMO BLDG.5 1-10-14 KITAUENO TAITO-KUTOKYO 110-0014 Japan
|
|
346
|
東京エレクトロン株式会社 Tokyo Electron LTD.
|
〒107-6325東京都港区赤坂五丁目3番1号 赤坂Bizタワー AkasakaBiz Tower 3-1 Akasaka 5-chome, Minato-ku,Tokyo 107-6325
|
|
347
|
東京計器株式会社 TOKYO KEIKI Inc.
|
〒144-8551東京都大田区南蒲田2-16-46 2-16-46, Minami-Kamata, Ohta-ku, Tokyo 144-8511Japan
|
|
348
|
株式会社東京精密 Tokyo Seimitsu CO., LTD.
|
〒192-8515東京都八王子市石川町2968-2 2968-2, Isikawa-machi, Hachioji-city, Tokyo 192-8515Japan
|
|
349
|
東京貿易テクノシステム株式会社 TOKYO BOEKI TECHNOーSYSTEM LTD.
|
〒104-0031東京都中央区京橋2-2-1 2-2-1 Kyobashi Chuo-ku, Tokyo Japan
|
|
350
|
東京貿易マテリアル株式会社 TOKYO BOEKI MATERIALS LTD.
|
〒104-0031東京都中央区京橋2-2-1 2-2-1 Kyobashi, Chuo-ku, Tokyo 104-0031 Japan
|
|
351
|
株式会社 東興 TOKO CO.,LTD
|
〒104-0031東京都中央区1丁目6番12号 京橋イーサスビル9階 9F. KYOBASHI Y’SUS BLDG. 6-12 KYOBASHI 1-CHOMECHUO-KU TOKYO 104-0031 JAPAN
|
|
352
|
東工コーセン株式会社
|
〒東京都千代田区四番町4-2 BANビル
|
|
353
|
東西貿易株式会社 TOZAI BOEKI KAISHA, LTD.
|
〒103-0023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1-2-6 日本橋本町スクエア4階 2-6, NIHONBASHI-HONCHOU, 1-CHOME, CHUO-KU,TOKYO 103-0023 JAPAN
|
|
354
|
株式会社東芝 Toshiba Corp.
|
〒105-8001東京都港区芝浦1-1-1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
|
355
|
東芝インフラシステムズ株式会社 Toshiba Infrastructure Systems & SolutionsCorporation
|
〒212-8585神奈川県川崎市幸区堀川町72番地34 72-34, Horikawa-cho, Saiwai-ku, Kawasaki-shi,Kanagawa
|
|
356
|
東芝機械株式会社 Toshiba Mashine CO., LTD.
|
〒100-8503東京都千代田区内幸町2丁目2番2号 富国生命ビル 2-2, Uchisaiwai-cho 2-chome, Chiyoda-ku, Tokyo 100-8503 Japan
|
|
357
|
東芝テック株式会社 TOSHIBA TEC. Corp.
|
〒141-8562東京都品川区大崎 1-11-1 ゲートシティ大崎ウエストタワー Gate City Osaki West Tower 1-11-1,Osaki,Shinagawa-ku,Tokyo,141-8562, Japan
|
|
358
|
東芝デバイス株式会社 TOSHIBA DEVICE Corp.
|
〒212-0013川崎市幸区堀川町580 ソリッドスクエアビル西館 SOLID SQUARE BLD.WEST 580 HORIKAWA-CHO,SAIWAI-KU, KAWASAKI 212-0013 Japan
|
|
359
|
東芝マイクロ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Toshiba Microelectronics Corp.
|
〒212-0013神奈川県川崎市幸区堀川町580番地ソリッドスクエア東館9階 SOLID SQUARE BLD.EAST 9F,580 Horikawacho,Saiwai-ku Kawasaki, 212-0013,Japan
|
|
360
|
東芝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Toshiba Trading Inc.
|
〒210-0024神奈川県川崎市川崎区日進町7-1 川崎日進町ビルディング15階 7-1, Nissin-cho,Kawasaki-Ku,Kawasaki,Kanagawa210-0024,Japan
|
|
361
|
東芝三菱電機産業システム株式会社 Toshiba Mitsubishi-Electric IndustrialSyatems Corp.
|
〒104-0031東京都中央区京橋三丁目1番1号 3-1-1 Kyobashi,Chuo-ku, Tokyo 104-0031 Japan
|
|
362
|
東芝メモリ株式会社 Toshiba Memory Corporation
|
〒105-0023東京都港区芝浦1-1-1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0023,Japan
|
|
363
|
東北パイオニア株式会社 TOHOKU PIONEER Corp.
|
〒山形県天童市大字久野本字日光1105番地 1105 KUNOMOTO, TENDO, YAMAGATA, Japan
|
|
364
|
株式会社 童夢 DOME CO., LTD
|
〒521-0013滋賀県米原市梅ヶ原2462番地 2462, Umegahara, Maibara-shi, Shiga, 521-0013,Japan
|
|
365
|
東洋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Toyo Engineering
|
〒100-6511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丁目5番1号 11th F1.,Shin-Marunouchi Building 1-5-1 MarunouchiChiyoda-ku,Tokyo 100-6511,Japan
|
|
366
|
東洋精機工業株式会社 TOYO SEIKI KOGYO CO.,LTD
|
〒391-8585長野県茅野市宮川2715番地 2715 Miyagawa,Chino-shi,Nagano-ken,391-8585,Japan
|
|
367
|
東洋炭素株式会社 TOYO TANSO CO., LTD.
|
〒555-0011大阪市西淀川区竹島5-7-12 5-7-12 Takeshima,Nishiyodogawa-ku,Osaka
|
|
368
|
株式会社東陽テクニカ Toyo Corp.
|
〒東京都中央区八重洲1-1-6 1-6, Yaesu 1-Chome, Chuo-ku, Tokyo
|
|
369
|
東洋電機製造株式会社 TOYO DENKISEIZO K.K.
|
〒103-0028東京都中央区八重洲一丁目4番16号 東京建物八重洲ビル5階 Tokyo Tatemono Yaesu Building 5F 1-4-16, Yaesu,Chuou-ku ,Tokyo,103-0028,Japan
|
|
370
|
東洋紡株式会社 TOYOBO CO., LTD.
|
〒530-8230大阪府大阪市北区堂島浜2-2-8 2-8, Dojima Hama 2-chome, Kita-Ku, Osaka, 530-8230, JAPAN
|
|
371
|
東レ株式会社 Toray Industries, Inc.
|
〒103-8666東京都中央区日本橋室町2-1-1 1-1, Nihonbashi-Muromachi 2-chome, Chuo-ku,Tokyo 103-8666, Japan
|
|
372
|
東レインターナショナル株式会社 TORAY INTERNATIONAL ,INC.
|
〒103-0023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3丁目1番1号 1-1, Nihonbashi-Honcho 3-Chome, Chuo-ku,Tokyo103-0023,JAPAN
|
|
373
|
東レ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Toray Engineering Co., Ltd.
|
〒103-0028東京都中央区八重洲1-3-22 3-22, Yaesu 1-chome, Chuo-ku, Tokyo 103-0028JAPAN
|
|
374
|
東レ・デュポン株式会社 DU PONT-TORAY CO., LTD.
|
〒103-0023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1-1-1 1-1, Nihonbashi Honcho 1-chome, Chuo-ku, Tokyo,103-0023
|
|
375
|
株式会社東レリサーチセンター Toray Research Center,Inc.
|
〒103-0023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一丁目1番1号 1-1-1,Nihonbashi-Honcho,Chuo-ku,Tokyo 103-0023
|
|
376
|
株式会社トーキン Tokin Corporation
|
〒982-8510仙台市太白区郡山6-7-1 7-1, Kohriyama 6-chome, Taihaku-Ku, Sendai-ShiMiyagi 982-8510, Japan
|
|
377
|
株式会社ネクスティエレクトロニクス NEXTY Electronics Corporation
|
〒108-8510東京都港区港南2-3-13 品川フロントビル 2-3-13, Konan, Minato-ku, Tokyo, 108-8510, Japan
|
|
378
|
株式会社トーメンデバイス TOMEN DEVICES Corp.
|
〒104-6230東京都中央区晴海1-8-12 8-12, Harumi 1-chome, Chuo-ku, Tokyo 104-6230Japan
|
|
379
|
トーヨーエイテック株式会社 Toyo Adovanced Technologies CO., LTD.
|
〒734-8501広島県広島市南区宇品東5-3-38 5-3-38, Ujina-Higashi, Minami-ku, Hiroshima 734-8504,Japan
|
|
380
|
株式会社トクヤマ Tokuyama Corporation
|
〒745-8648山口県周南市御影町1-1 1-1, Mikage-cho,Shunan city,Yamaguchi 745-8648, Japan
|
|
381
|
凸版印刷株式会社 TOPPAN PRINTING CO., LTD.
|
〒110-8560東京都台東区台東1丁目5番1号 1-5-1 Taito, Taito-ku, Tokyo 110-8560
|
|
382
|
株式会社トッパン・テクニカル・デザインセンター TOPPAN TECHNICAL DESIGN CENTER Co.,LTD.
|
〒110-0016東京都台東区台東1-5-1 1-5-1 Taito, Taito-ku, Tokyo 110-0016, Japan
|
|
383
|
トピー工業株式会社 TOPY INDUSTRIES, LIMITED
|
〒141-8634東京都品川区大崎一丁目2番2号 1-2-2, Osaki, Shinagawa-ku, Tokyo 141-8634, Japan
|
|
384
|
株式会社トプコン Topcon Corp.
|
〒東京都板橋区蓮沼町75-1 75-1, Hasunuma-Cho, Itabashi-ku, Tokyo, 174-8580,Japan
|
|
385
|
巴工業株式会社 TOMOE Engineering Co., Ltd.
|
〒141-0001東京都品川区北品川五丁目5番15号 大崎ブライトコア Osaki Bright Core, 5-15, Kitashinagawa 5-ChomeShinagawa-Ku, Tokyo 141-0001, Japan
|
|
386
|
巴バルブ株式会社 TOMOE VALVE CO., LTD.
|
〒550-0013大阪府大阪市西区新町3-11-11 3-11-11 Shinmachi, Nishi-ku, osaka 550-0013, Japan
|
|
387
|
豊田合成株式会社 Toyoda Gosei CO., LTD.
|
〒452-8564愛知県清須市春日長畑1番地 1 Haruhinagahata Kiyosu, Aichi, 452-8564, Japan
|
|
388
|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Toyota Motor Corp.
|
〒471-8571愛知県豊田市トヨタ町1 1, Toyota-cho, Toyota, Aichi, Japan 471-8571
|
|
389
|
株式会社豊田自動織機 Toyota Industries Corp.
|
〒愛知県刈谷市豊田町2-1 2-1, TOYODA-CHO, KARITA, AICHI
|
|
390
|
豊田通商株式会社 Toyota Tsusho Corp.
|
〒450-8575名古屋市中村区名駅4-9-8 センチュリー豊田ビル Century Toyota Bldg. 9-8, Meieki 4-chome,Nakamura-ku Nagoya, 450-8575, Japan
|
|
391
|
トヨタ紡織株式会社 TOYOTA BOSHOKU Corp.
|
〒448-8651愛知県刈谷市豊田町1丁目1番地 1-1, TOYOTA-CHO, KARIYA, AICHI, Japan ZIP448-8651
|
|
392
|
豊通ケミプラス株式会社 TOYOTSU CHEMIPLAS Corp.
|
〒108-8216東京都港区港南2-3-13 品川フロントビル Shinagawa Front Bldg. 3-13, Konan 2-Chome,Minato-ku,Tokyo 108-8216, Japan
|
|
393
|
株式会社豊通マシナリー TOYOTSU MACHINERY CORPORATION
|
〒450-0002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四丁目11番27号 シンフォニー豊田ビル Symphony Toyota Bldg ., 4-11-27, Meieki Nakamura-ku, Nagoya-shi, Aichi, 450-0002, Japan
|
|
394
|
株式会社トリケミカル研究所 Trichemical Laboratories Inc.
|
〒山梨県上野原市上野原8154-217 8154-217, Uenohara, Uenohara-shi, Yamanashi 409-0112 Japan
|
|
395
|
トレックス・セミコンダクター株式会社 TOREX SEMICONDUCTOR LTD.
|
〒104-0033東京都中央区新川1丁目24-1 1-24-1 Shinkawa, Chuo-Ku, Tokyo 104-0033 Japan
|
|
396
|
ナイトライド・セミコンダクター株式会社 Nitride Semiconductors Co.,Ltd.
|
〒771-0360徳島県鳴門市瀬戸町明神板屋島115-7 115-7 Itayashima, Akinokami,Seto-cho, Naruto-shi,Tokushima 771-0360
|
|
397
|
長瀬産業株式会社 Nagase&Co, LTD.
|
〒550-8668大阪府大阪市西区新町1-1-17 1-1-17 Shinmachi, Nishi-ku, Osaka City, Osaka 550-8668 Japan
|
|
398
|
中村留精密工業株式会社 Nakamura Tome Precision Industry CO.,LTD.
|
〒920-2195石川県白山市熱野町ロ15 RO-15, Netsuno, Hakusan, Ishikawa, 920-2195, Japan
|
|
399
|
株式会社ナカヨ通信機 NAKAYO TELECOMMUNICATIONS, Inc.
|
〒371-0853群馬県前橋市総社町1丁目3番2号 1-3-2, Sojamachi, Maebashi-shi, Gumma, 371-0853,Japan
|
|
400
|
ナブテスコ株式会社 Nabtesco Corporation
|
〒102-0093東京都千代田区平河町二丁目7番9号 JA共済ビル JA Kyosai Bldg., 7-9, Hirakawacho 2-chome,Chiyoda-ku, Tokyo 102-0093., Japan
|
|
401
|
鍋林株式会社 Nabelin CO., LTD.
|
〒390-8722長野県松本市中央3丁目2番27号 2-27 Chuo 3chome Matsumoto city Nagano pref,Japan.390-8722
|
|
402
|
株式会社ニイガタマシンテクノ Niigata Machine Techno CO., LTD.
|
〒950-0821新潟県新潟市東区岡山1300番地 1300 Okayama, Higashi-ku, Niigata City, Niigata PrepJapan
|
|
403
|
株式会社ニコン Nikon Corporation
|
〒108-6290東京都港区港南二丁目15番3号 2-15-3, Konan, Minato-ku, Tokyo, 108-6290, Japan
|
|
404
|
株式会社ニコンテック Nikon Tec Corp.
|
〒140-0012東京都品川区勝島1-5-21 5-21, Katsushima 1-Chome, Shinagawa-ku, Tokyo 140-0012, Japan
|
|
405
|
西芝電機株式会社 Nishishiba Electric CO., LTD.
|
〒671-1280兵庫県姫路市網干区浜田1000 1000 Hamada, Aboshi-ku, Himeji, 671-1280, Japan
|
|
406
|
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WestCorp.
|
〒540-8511大阪府大阪市中央区馬場町3-15 3-15, Banba-cho, Chuo-ku, Osaka 540-8511
|
|
407
|
西日本貿易株式会社 WESTERN JAPAN TRADING CO., LTD.
|
〒541-0045大阪府大阪市中央区道修町4-4-10 NO.4-10, 4-CHOME, DOSHOMACHI、 CHUO-KUOSAKA,JAPAN
|
|
408
|
株式会社西村製作所 NISHIMURA MFG.CO.,LTD.
|
〒601-8113京都府京都市南区上鳥羽南苗代町21番地 21MINAMI NAWASHIRO-CHO,KAMITOBA,MINAMI-KU,KYOTO 601-8113,JAPAN
|
|
409
|
株式会社ニシヤマ NISHIYAMA Corporation
|
〒143-0016東京都大田区大森北4-11-11 4-11-11, Omorikita, Ota-ku, Tokyo 143-0016,Japan
|
|
410
|
日亜化学工業株式会社 NICHIA Corp.
|
〒774-8601徳島県阿南市上中町岡491番地 491 Oka, Kaminaka-Cho, Anan-Shi, TOKUSHIMA 774-8601, Japan
|
|
411
|
日油株式会社 NOF CORPORATION
|
〒150-6019東京都渋谷区恵比寿四丁目20番3号 20-3, Ebisu 4-chome,Shibuya-ku, Tokyo 150-6019,Japan
|
|
412
|
日揮株式会社 JGC CORPORATION
|
〒100-0004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2丁目2番1号 2-2-1, Ohtemachi, Chiyoda-ku, Tokyo 100-0004,Japan
|
|
413
|
日機装株式会社
|
〒150-8677東京都渋谷区恵比寿4-20-3恵比寿ガーデンプレイスタワー22階
|
|
414
|
日産化学株式会社 Nissan Chemical Corporation
|
〒103-6119東京都中央区日本橋二丁目5番1号 5-1, Nihonbashi 2-chome, Chuo-ku, Tokyo 103-6119,Japan
|
|
415
|
日産自動車株式会社 NISSAN MOTOR CO., LTD.
|
〒220-8023神奈川県横浜市神奈川区宝町2番地 2, Takara-cho, Kanagawa-ku, Yokohama-shi,Kanagawa
|
|
416
|
日産トレーデイング株式会社 NISSAN TRADING CO.,LTD.
|
〒244-0805神奈川県横浜市戸塚区川上町91-1 91-1 Kawakami-cho,Totsuka-ku,Yokohama,Kanagawa 244-0805 Japan
|
|
417
|
日昌株式会社 NISSHO Corp.
|
〒530-0047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4-8-17 宇治電ビルディング4階 Ujiden Building, 4F Floor 8-17,Nishitenma 4-Chome,Kita-ku, Osaka 530-0047, Japan
|
|
418
|
日商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NISSHO ELECTRONICS CORP.
|
〒102-0084東京都千代田区二番町3-5麹町三葉ビル6F 3-5, Nibancho, Chiyoda-ku, Tokyo 102-0084, Japan
|
|
419
|
日新イオン機器株式会社 Nissin Ion Equipment Co., Ltd.
|
〒601-8205京都市南区久世殿城町575番地 575,Kuze-Tonoshiro-Cho, Minami-ku, Kyoto 601-8205,Japan
|
|
420
|
日新電機株式会社 Nissin Electric CO., LTD.
|
〒615-8686京都府右京区梅津高畝町47番地 47, Umezu-takase-cho, Ukyo-ku, Kyoto, 615-8686Japan
|
|
421
|
日精株式会社 NISSEI COMPANY LTD.
|
〒530-0011大阪市北区大深町3番1号グランフロント大阪タワーB12階 12th FL,GRAND FRONT OSAKA TOWER B,3-1OFUKACHO,KITAKU,OSAKA,JAPAN
|
|
422
|
日精エー・エス・ビー機械株式会社 Nissei ASB Machine Co, . LTD.
|
〒384-8585長野県小諸市甲4586番地3号 4586-3 Koo, Komoro-shi, Nagano-ken 384-8585,Japan
|
|
423
|
日曹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NISSO ENGINEERING CO., LTD.
|
〒101-0051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6-1 東京タキイビル TokyoTakii Bldg., 6-1, 1-Chome, Kanda Jinbo-ChoChiyoda-ku, Tokyo 101-0051 Japan
|
|
424
|
日曹商事株式会社 Nisso Shoji CO., LTD.
|
〒104-8422東京都中央区日本橋本町3-3-6 ワカ末ビル Wakamatsu Bldg., 3-3-6, Nihonbashi-Honcho Chuo-ku Tokyo 103-8422Japan
|
|
425
|
日通NECロジスティクス株式会社 Nittsu NEC Logistics, LTD.
|
〒211-0063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小杉町一丁目403番地 1-403, Kosugi-cho, Nakahara-Ku, Kawasaki-shi,Kanagawa 211-0063 Japan
|
|
426
|
日鉄物産株式会社 NIPPON STEEL TRAIDING CORPORATION
|
〒107-8527東京都港区赤坂8丁目5番27号 5-27, Akasaka 8-chome, Minato-ku, Tokyo 107-8527
|
|
427
|
日東電工株式会社 Nitto Denko Corp.
|
〒567-8680大阪府茨木市下穂積1-1-2 1-1-2, Shimohozumi, Ibaraki, Osaka 567-8680, Japan
|
|
428
|
ニッペ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NIPPE TRADING CO., LTD.
|
〒大阪府吹田市江坂町1丁目22番26号 1-22-26 Esaka, Suita City, Osaka
|
|
429
|
日本アビオニクス株式会社 Nippon Avionics Co., Ltd.
|
〒141-0031東京都品川区西五反田八丁目1番5号 1-5, Nishi-Gotanda 8-Chome, Shinagawa-Ku, Tokyo,141-0031 Japan
|
|
430
|
日本タングステン株式会社 NIPPON TUNGSTEN CO., LTD.
|
〒福岡市博多区美野島1丁目2番8号 2-8, MINOSHIMA 1-CHOME, HAKATA-KU, FUKUOKA,812-8538Japan
|
|
431
|
日本電気株式会社 NEC Corp.
|
〒東京都港区芝5-7-1 7-1, Shiba 5-Chome, Minato-ku, Tokyo 108-8001
|
|
432
|
日本電気通信システム株式会社 NEC Communication Systems, LTD.
|
〒108-0073東京都港区三田一丁目4-28 三田国際ビル Mita Kokusai Bldg. 4-28, Mita 1-chome, Minato-ku,Tokyo 108-0073, Japan
|
|
433
|
日本トムソン株式会社 Nippon Thomson CO., LTD.
|
〒東京都港区高輪2-19-19 19-19, Takanawa 2-Chome Minato-ku, Tokyo, Japan
|
|
434
|
日本パルスモーター株式会社 NIPPON PULSE MOTOR CO., LTD.
|
〒113-0033東京都文京区本郷2丁目16番13号 No.16-13, 2-Chome Hongo, Bunkyo-ku, Tokyo 113-0033, Japan
|
|
435
|
日本アンテナ株式会社 NIPPON ANTENNA CO.,LTD
|
〒116-8561東京都荒川区西尾久7丁目49番8号 7-49-8 Nishi Ogu, Arakawa-ku, Tokyo, JAPAN
|
|
436
|
日本板硝子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Nippon Sheet Glass Engineering Co.,Ltd.
|
〒541-0051大阪市中央区備後町3-4-1山口玄ビル3階 Yamaguchi Gen Bldg. 3F,3-4-1,Bingo-machi,Chuo-ku,Osaka, 541-0051,Japan
|
|
437
|
日本エー・エス・エム株式会社 ASM Japan K.K.
|
〒206-0025東京都多摩市永山6-23-1 23-1, 6-chome Nagayama, Tama-shi, Tokyo 206-0025Japan
|
|
438
|
日本オクラロ株式会社 Oclaro Japan, Inc.
|
〒252-5250神奈川県相模原市中央区小山4-1-55 4-1-55 Oyama, Chuo-ku, Sagamihara, Kanagawa,252-5250 Japan
|
|
439
|
日本碍子株式会社 NGK Insulators, LTD.
|
〒467-8530愛知県名古屋市瑞穂区須田町2-56 2-56 Suda-Cho, Mizuho-Ku Nagoya 467-8530, Japan
|
|
440
|
日本化学産業株式会社 nihonkagakusangyo.co.jp
|
〒東京都台東区下谷2-20-5 20-5, SHITAYA 2-CHOME TAITO-KU TOKYO Japan
|
|
441
|
日本航空電子工業株式会社 Japan Aviation Electronics Industry, Limited
|
〒150-0043東京都渋谷区道玄坂1-10-8 10-8, Dogenzaka 1-chome, Shibuya-ku, Tokyo 150-0043 Japan
|
|
442
|
日本精工株式会社 NSK Ltd.
|
〒141-8560東京都品川区大崎1-6-3(日精ビル) Nissei Bldg., 1-6-3 Ohsaki, Shinagawa-Ku, Tokyo, 141-8560, Japan
|
|
443
|
株式会社日本製鋼所 The Japan Steel Works, LTD.
|
〒141-0032東京都品川区大崎1丁目11番1号 ゲートシティ大崎ウエストタワー Gate City Ohsaki-West Tower, 11-1,Ohsaki 1-chome,Shinagawa-ku, Tokyo 141-0032,Japan
|
|
444
|
日本曹達株式会社 Nippon Soda CO., LTD.
|
〒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2-2-1 2-1, Ohtema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8165, Japan
|
|
445
|
日本テキサス・インスツルメンツ合同会社 Texas Instruments Japan Limited
|
〒160-8366東京都新宿区西新宿6-24-1 西新宿三井ビル Nishi-Shinjuku Mitsui Bldg.,6-24-1,Nishi-Shinjuku,Shinjuku-ku,Tokyo 160-8366,Japan
|
|
446
|
日本電計株式会社 Nihon Denkei Co.,Ltd.
|
〒110-0005東京都台東区上野5-14-12 14-12,Ueno 5-chome,Taito-ku,Tokyo,110-0005 Japan
|
|
447
|
日本電産株式会社 Nidec Corp.
|
〒601-8205京都府京都市南区久世殿城町338 338 Tonoshiro-cho, Kuze Minami-ku, Kyoto 601-8205Japan
|
|
448
|
日本電子株式会社 JEOL LTD.
|
〒東京都昭島市武蔵野3-1-2 3-1-2, Musashino Akishima Tokyo 196-8558
|
|
449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
|
〒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2-3-1 3-1 Otemachi 2-Chome Chiyoda-Ku JP-TOKYO
|
|
450
|
日本電波工業株式会社 Nihon Dempa Kogyo CO., LTD.
|
〒151-8569東京都渋谷区笹塚1-47-1 メルクマール京王笹塚 Merkmal Keio Sasazuka Bldg., 6F, 1-47-1 Sasazuka,Sibuya-ku, Tokyo, 151-8569, Japan
|
|
451
|
日本トレルボルグ シーリング 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Trelleborg Sealing Solutions Japan K.K.
|
〒135-0016東京都江東区東陽7-1-1 7-1-1 Toyo Koto-ku Tokyo 135-0016
|
|
452
|
日本ヒューレット・パッカード株式会社 Hewlett-Packard Japan Ltd.
|
〒136-8711東京都江東区大島2-2-1 2-2-1 Ojima, Koto-ku, Tokyo, 136-8711 Japan
|
|
453
|
日本無線株式会社 Japan Radio Co.,Ltd.
|
〒181-0002東京都三鷹市牟礼 6-21-11 6-21-11,Mure,Mitaka-shi,Tokyo 181-0002,Japan
|
|
454
|
日本ユニシス株式会社 Nihon Unisys,Ltd.
|
〒135-8560東京都江東区豊洲1-1-1 1-1-1 Toyosu, Koto-ku, Tokyo 135-8560 Japan
|
|
455
|
株式会社ニューフレアテクノロジー NuFlare Technology, Inc.
|
〒235-0032神奈川県横浜市磯子区新杉田町8番1 8,Shinsugita-cho,Isogo-ku,Yokohama,Japan 235-0032
|
|
456
|
株式会社ニレコ NIRECO CORPORATION
|
〒192-8522東京都八王子市石川町2951-4 2951-4, ishikawa-machi, Hachioji-shi, Tokyo 192-8522japan
|
|
457
|
株式会社ヌマタ NUMATA CORPORATION
|
〒550-0015大阪府大阪市西区南堀江4丁目1番20号 No.1-20,4-chome,Minami Horie,Nishi-Ku,Osaka,550-0015,Japan
|
|
458
|
野村貿易株式会社 Nomura Trading CO., LTD.
|
〒大阪府大阪市中央区安土町1-7-3 7-3, Azuchi-machi, 1-chome, Chuo-ku, Osaka 541-8542, Japan
|
|
459
|
野村マイクロ・サイエンス株式会社 Nomura Micro Science CO., LTD.
|
〒243-0021神奈川県厚木市岡田2-9-8 2-9-8 OKADA ATSUGI-CITY, KANAGAWA 243-0021Japan
|
|
460
|
株式会社パーキンエルマージャパン Perkin Elmer Japan CO., LTD.
|
〒240-0005神奈川県横浜市保土ヶ谷区神戸町134 横浜ビジネスパーク テクニカルセンター 4F Technical Center 4F, Yokohama Business Park 134Godo-cho, Hodogaya-ku, Yokohama, 240-0005Japan
|
|
461
|
パイオニア株式会社 Pioneer Corporation.
|
〒113-0021東京都文京区本駒込2-28-8 文京グリーンコート 28-8, Honkomagome 2-Chome,Bunkyo-ku, Tokyo 113-0021,Japan
|
|
462
|
パイオニアデジタルデザインアンド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株式会社 Pioneer Digital Design and ManufacturingCorporation
|
〒112-0002東京都文京区小石川5-5-5 5-5-5,Koishikawa,Bunkyo-ku,Tokyo 112-0002,Japan
|
|
463
|
パイオニアマイクロ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PIONEER MICRO TECHNOLOGY Corp.
|
〒400-0053山梨県甲府市大里町465 400-0053 465 OSATO-CHO, KOFU-SHI, YAMANASHI-KEN
|
|
464
|
HIREC株式会社 High-Reliability Engineering & ComponentsCorporation
|
〒212-8554神奈川県川崎市幸区大宮町1310番地 1310 Omiya-cho Saiwai-ku Kawasaki-shi,Kanagawa,212-8554,Japan
|
|
465
|
伯東株式会社 HAKUTO CO., LTD.
|
〒東京都新宿区新宿1-1-13 1-13, SHINJUKU 1-CHOME, SHINJUKU-KU, TOKYO,Japan
|
|
466
|
株式会社パスコ PASCO CORPORATION
|
〒153-0043東京都目黒区東山1-1-2 東山ビル 1-1-2 Higashiyama, Meguro-Ku Tokyo 153-0043 Japan
|
|
467
|
パナソニック株式会社 Panasonic Corp.
|
〒571-8501大阪府門真市大字門真1006番地 1006 Kadoma, Kadoma City, Osaka 571-8501, Japan
|
|
468
|
パナソニック・タワージャズ セミコンダクター株式会社 TowerJazz Panasonic Semiconductor Co.,Ltd.
|
〒937-8585富山県魚津市東山800番地 800 Higashiyama, Uozu City, Toyama 937-8585,Japan
|
|
469
|
パナソニック デバイスSUNX株式会社 Panasonic Industrial Devices SUNX CO.,LTD.
|
〒486-0901愛知県春日井市牛山町2431-1 2431-1, Ushiyama-cho, Kasugai, Aichi 486-0901,Japan
|
|
470
|
PHC株式会社 PHC Corporation
|
〒791-0395愛媛県東温市南方2131番地1 2131-1 Minamigata, Toon City, Ehime 791-0395,Japan
|
|
471
|
浜松ホトニクス株式会社 Hamamatsu Photonics K.K.
|
〒435-8558静岡県浜松市東区市野町1126-1 1126-1, Ichino-cho, Higashi-Ku, Hamamatsu city,Shizuoka Pref., 435-8558 Japan
|
|
472
|
ハリマ化成株式会社 Harima Chemicals, Inc.
|
〒675-0019兵庫県加古川市野口町水足671-4 671-4 Mizuashi, Noguchi-cho, Kakogawa, Hyogo,Japan
|
|
473
|
パワーテックテクノロジー秋田株式会社 Powertech Technology Akita
|
〒010-1222秋田県秋田市雄和石田字山田89番地2 89-2, Yamada, Yuwaishida, Akita-shi, Akita 010-1222,Japan
|
|
474
|
阪神内燃機工業株式会社 THE HANSHIN DIESEL WORKS, LTD.
|
〒神戸市中央区海岸通8番 神港ビル4F Shinko Bldg., 8, Kaigan-dori, Chuo-ku, Kobe, Japan
|
|
475
|
バンドー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BANDO TRADING CO.,LTD
|
〒652-0883兵庫県神戸市兵庫区明和通3丁目3番17号 3-17,Meiwadoori 3-chome,Hyougo-ku,kobe,650-0047Japan
|
|
476
|
ビアメカニクス株式会社 Via Mechanics, Ltd.
|
〒243-0488神奈川県海老名市上今泉2100番地 2100 Kami-imaizumi, Ebina-shi, Kanagawa-ken, 243-0488 Japan
|
|
477
|
株式会社PFA PFA CORPORATION
|
〒350-0286埼玉県坂戸市千代田5-7-1 5-7-1 Chiyoda,Sakado-shi,Saitama 350-0286 Japan
|
|
478
|
株式会社PFU PFU LIMITED
|
〒石川県かほく市宇野気ヌ98-2 929-1192 Nu 98-2 Unoke, Kahoku-shi, Ishikawa
|
|
479
|
PFUテクノコンサル株式会社 PFU TECHNOCONSUL Limited
|
〒929-1192石川県かほく市宇野気ヌ98-2 Nu 98-2 Unoke, kahoku-shi, Ishikawa
|
|
480
|
ビーエム長野株式会社 B. M. NAGANO CO., LTD.
|
〒102-0084東京都千代田区二番町10番地3 10-3, Niban-cho, Chiyoda-ku, tokyo 102-0084, Japan
|
|
481
|
東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EastCorp.
|
〒163-8019東京都新宿区西新宿3-19-2 19-2 Nishi-Shinjuku 3-Chome Shinjuku-ku, Tokyo 163-8019 Japan
|
|
482
|
株式会社日阪製作所 HISAKA WORKS, LTD.
|
〒541-0044大阪府大阪市中央区伏見町4-2-14 4-2-14 FUSHIMI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44
|
|
483
|
日立化成株式会社 Hitachi Chemical Co., Ltd.
|
〒100-6606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一丁目9番2号 9-2,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6606, Japan
|
|
484
|
日立キャピタル株式会社 Hitachi Capital Corp.
|
〒105-0003東京都港区西新橋一丁目3番1号西新橋スクエア nishi-shimbashi square, 3-1, Nishi Shimbashi 1-chome,Minato-ku, Tokyo,105-8712, Japan
|
|
485
|
日立金属株式会社 Hitachi Metals, LTD.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一丁目2番70号 品川シーズンテラス Shinagawa Season Terrace 2-70, Konan 1-chome,Minato-ku, Tokyo 108-0075 Japan
|
|
486
|
日立金属商事株式会社 Hitachi metals Trading, Ltd.
|
〒104-0032東京都中央区八丁堀2-9-1 RBM東八重洲ビル 9-1 Hacchobori 2-chome, Chuo-ku, Tokyo 104-0032
|
|
487
|
日立建機株式会社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
〒112-8563東京都文京区後楽2-5-1 5-1, Koraku, 2-chome, Bunkyo-ku, Tokyo 112-8563Japan
|
|
488
|
工機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Koki Holdings CO., LTD.
|
〒108-6020東京都港区港南2-15-1 品川インターシティA棟 Shinagawa Intercity Tower A 15-1, Konan 2-Chome,Minato-ku, Tokyo 108-6020, Japan
|
|
489
|
株式会社日立国際電気 Hitachi Kokusai Electric Inc.
|
〒105-8039東京都港区西新橋二丁目15番12号 15-12, Nishi-shimbashi 2-chome, Minato-ku, TOKYO105-8039, Japan
|
|
490
|
株式会社日立産機システム Hitachi Industrial Equipment Systems Co.,Ltd.
|
〒101-0022東京都千代田区神田練塀町3番地 AKS Building, 3, Kanda Neribei-cho, Chiyoda-ku,Tokyo, 101-0022, Japan
|
|
491
|
株式会社日立製作所 Hitachi, LTD.
|
〒100-8280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6-6 6-6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280, Japan
|
|
492
|
株式会社日立ソリューションズ Hitachi Solutions, LTD.
|
〒140-0002東京都品川区東品川四丁目12番7号 4-12-7, Higashishinagawa, Shinagawa-ku, Tokyo, 140-0002, Japan
|
|
493
|
株式会社日立ソリューションズ・テクノロジー Hitachi Solutions Technology, Ltd.
|
〒190-0014東京都立川市緑町7番地1 7-1 Midori-cho, Tachikawa-shi, Tokyo, Japan
|
|
494
|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サイエンス Hitachi High-Tech Science Corporation
|
〒105-0003東京都港区西新橋一丁目24番14号 24-14,Nishi-shimbashi 1-chome,Minato-ku Tokyo 105-0003,Japan
|
|
495
|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ソリューションズ Hitachi Hight-Tech Solutions Corporation
|
〒104-6031東京都中央区晴海1-8-10(晴海トリトンスクエア オフィスタワーX) Harumi Triton Square Office Tower X 1-8-10, Harumi,Chuo-ku, Tokyo, 104-6031, JAPAN
|
|
496
|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ノロジーズ Hitachi High-Technologies Corp.
|
〒105-8717東京都港区西新橋1-24-14 24-14, Nishi-Shimbashi 1-chome, Minato-ku, Tokyo105-8717, Japan
|
|
497
|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ファインシステムズ Hitachi High-Tech Fine Systems Corporation
|
〒396-0395埼玉県児玉郡上里町嘉美1600番地 1600 Kami,kamisato-machi,Kodama-gun,Saitama,369-0395,JAPAN
|
|
498
|
株式会社日立ハイテクフィールディング Hitachi High-Tech Fielding Corp.
|
〒160-0004東京都新宿区四谷4-28-8 28-8, Yotsuya 4-chome, Shinjuku-ku Tokyo, 160-0004Japan
|
|
499
|
日野自動車株式会社 Hino Motors, LTD.
|
〒191-8660東京都日野市日野台 3-1-1 3-1-1, Hino-dai, Hino-shi, Tokyo 191-8660, Japan
|
|
500
|
株式会社ファインシンター Fine Sinter Co.,Ltd.
|
〒480-0303愛知県春日井市明知町西之洞1189番地11 1189-11,Nishinohora,Akechi-cho,Kasugai,Aichi,480-0303,Japan
|
|
501
|
ファナック株式会社 FANUC LTD.
|
〒401-0597山梨県忍野村 Oshino-mura, Yamanashi Prefecture 401-0597, Japan
|
|
502
|
株式会社ブイ・テクノロジー V-Technology CO., LTD.
|
〒神奈川県横浜市保土ヶ谷区神戸町134 134 Godo-cho Hodogaya-ku, Yokohama, Japan
|
|
503
|
株式会社フェローテック Ferrotec Corporation
|
〒103-0027東京都中央区日本橋2-3-4 日本橋プラザビル 5F Nihonbashi Plaza Building 2-3-4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
|
|
504
|
株式会社フェローテックセラミックス Ferrotec Ceramics Corporation
|
〒103-0027東京都中央区日本橋2-3-4 日本橋プラザビル5F 5F Nihonbashi Plaza Building 2-3-4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7
|
|
505
|
株式会社フェローテ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Ferrotec Holdings Corporation
|
〒103-0027東京都中央区日本橋 2-3-4 2-3-4 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7
|
|
506
|
フクダ電子株式会社 Fukuda Denshi CO., LTD.
|
〒13-8483東京都文京区本郷3-39-4 39-4, Hongo 3-chome, Bunkyo-ku, Tokyo 113-8483,Japan
|
|
507
|
株式会社フジクラ Fujikura LTD.
|
〒東京都江東区木場1-5-1 5-1, Kiba 1-Chome, Koto-ku, Tokyo 135-8512, Japan
|
|
508
|
株式会社不二越 Nachi-Fujikoshi Corp.
|
〒105-0021東京都港区東新橋1-9-2 1-9-2, Higashi-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21,JAPAN
|
|
509
|
株式会社不二精機製造所 FUJI SEIKI MACHINE WORKS, LTD.
|
〒静岡県駿東郡長泉町下土狩840 840 Shimotogari, Nagaizumi-cho, Sunto-gun,Shizuoka-pref., Japan
|
|
510
|
富士ゼロックス株式会社 Fuji Xerox CO., LTD.
|
〒107-0052東京都港区赤坂九丁目7番3号 ミッドタウン・ウェスト 9-7-3, Akasaka Minato-ku, Tokyo 107-0052, Japan
|
|
511
|
富士ゼロックスマニュファクチュアリング株式会社 Fuji Xerox Manufacturing Co., Ltd.
|
〒243-0417神奈川県海老名市本郷2274番地 2274, Hongo, Ebina, Kanagawa, 243-0417, Japan
|
|
512
|
富士ソフト株式会社 FUJISOFT INCORPORATED
|
〒231-8008神奈川県横浜市中区桜木町1ー1 1-1 Sakuragi-cho, Naka-ku, Yokohama-shi,Kanagawa 231-8008, Japan
|
|
513
|
富士通株式会社 Fujitsu Limited
|
〒211-8588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上小田中4-1-1 1-1, Kamikodanaka 4-chome, Nakahara-ku, Kwasaki,Kanagawa 211-8588, Japan
|
|
514
|
富士通アイ・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ズ株式会社 Fujitsu I・Network Systems Limited
|
〒211-0063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小杉町1-403 1-403, Kosugicho Nakahara-ku, Kawasaki-shi,Kanagawa 211-0063, Japan
|
|
515
|
富士通コンポーネント株式会社 Fujitsu Component Limited
|
〒140-8586東京都品川区東品川4-12-4 12-4, Higashi-shinagawa, 4-chome, shinagawa-ku,Tokyo, 140-8586
|
|
516
|
富士通ネットワークソリュージョンズ株式会社 FUJITSU NETWORK SOLUTIONS LIMITED
|
〒220-8711神奈川県横浜市西区高島一丁目1番2号 横浜三井ビルディング Yokohama Mitsui Bldg., 1-1-2, Takashima, Nishi-ku,Yokohama 220-8711, Japan
|
|
517
|
株式会社富士通ビー・エス・シー FIJITSU BROAD SOLUTION & CONSULTINGINC
|
〒135-8300東京都港区台場2-3-1(トレードピアお台場) Trade Odiba, 2-3-1 Daiba, Minato-ku, Tokyo 135-8300,Japan
|
|
518
|
フジテック株式会社 FUJITEC CO., LTD.
|
〒522-8588滋賀県彦根市宮田町591-1 591-1,MIYATA,HIKONE,SHIGA 522-8588 JAPAN
|
|
519
|
富士フイルム株式会社 FUJIFILM Corporation
|
〒106-8620東京都港区西麻布2-26-30 26-30, Nishiazabu 2-chome, Minato-ku, Tokyo 106-8620 Japan
|
|
520
|
富士フイルムエレクトロニクスマテリアルズ株式会社 FUJIFILM Electronic Materials CO., LTD.
|
〒150-0001東京都渋谷区神宮前6丁目19番20号 第15荒井ビル 15th Arai-Bldg., 19-20 Jingumae 6-chome,Shibuya-ku,Tokyo,150-0001 Japan
|
|
521
|
双葉電子工業株式会社 Futaba Corp.
|
〒297-8588千葉県茂原市大芝629 629 Oshiba, Mobara, Chiba Prefecture 297-8588,Jpan
|
|
522
|
Primetals Technologies Japan 株式会社 Primetals Technologies Japan, Ltd.
|
〒733-8553広島県広島市西区観音新町四丁目6-22 三菱重工業(株)広島製作所内 6-22, Kanoshin-machi, 4-Chome, Nishi-Ku, Hiroshima,733-8553 Japan
|
|
523
|
ブラザー工業株式会社 Brother Industries, LTD.
|
〒愛知県名古屋市瑞穂区苗代町15-1 15-1, Nashiro-Cho, Mizuho-ku, Nagoya 467-8561Japan
|
|
524
|
株式会社プラスチック工学研究所 RESEARCH LABORATORY OF PLASTICSTECHNOLOGY CO., LTD.
|
〒537-0144大阪府枚方市野村中町2番3号 2-3 NOMURANAKA-MACHI HIRAKATA-CITY OSAKA573-0144 Japan
|
|
525
|
プラント・メンテナンス株式会社 Plant Maintenance Corp.
|
〒101-0054東京都千代田区神田錦町3-17 廣瀬ビル8階 8th Floor, Hirose Bldg., 3-17, Kanda-Nishiki-Cho,Chiyoda-ku, Tokyo, 101-0054, Japan
|
|
526
|
古河電気工業株式会社 Furukawa Electric CO., LTD.
|
〒100-8322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6-1 6-1 Marunou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8322 Japan
|
|
527
|
古野電気株式会社 FURUNO ELECTRIC CO.,LTD.
|
〒662-8580兵庫県西宮市芦原町9番52号 9-52 ASHIHARA-CHO, NISHINOMIYA-CITY,662-8580Japan
|
|
528
|
兵神装備株式会社 HEISHIN Ltd.
|
〒652-0852兵庫県神戸市兵庫区御崎本町1-1-54 1-1-54, Misakihommachi, Hyogo-ku, Kobe, 652-0852Japan
|
|
529
|
株式会社日立ヘルスケア・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 Hitachi Healthcare Manufacturing, Ltd.
|
〒277-0804千葉県柏市新十余二2番地1 2-1, Sintoyofuta, kashiwa-shi, Chiba-ken, 277-0804Japan
|
|
530
|
豊和工業株式会社 HOWA MACHINERY, LTD.
|
〒452-8601愛知県清須市須ヶ口1900-1 1900-1, Sukaguchi, Kiyosu, Aichi, 452-8601 Japan 452-8601
|
|
531
|
ホーコス株式会社 HORKOS CORP
|
〒720-8650広島県福山市草戸町2-24-20 2-24-20 Kusado-cho, Fukuyama City, Hiroshima, 720-8650,Japan
|
|
532
|
HOYA株式会社 Hoya Corp.
|
〒160-8347東京都新宿区西新宿6-10-1 6-10-1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0-8347Japan
|
|
533
|
ホシデン株式会社 Hosiden Corp.
|
〒581-0071大阪府八尾市北久宝寺1-4-33 4-33, Kitakyuhoji 1-Chome, Yao-City, Osaka 581-0071Japan
|
|
534
|
株式会社ポシブル Possible Inc.
|
〒880-0951宮崎県宮崎市大塚町横立1453-6 1453-6,Yokotate,Otsuka-cho,Miyazaki 880-0951,JAPAN
|
|
535
|
株式会社堀場アドバンスドテクノ HORIBA Advanced Techno, CO., LTD.
|
〒京都市南区吉祥院宮の西町31番地 31 Miyanonishi-cho, Kisshoin Minami-ku, Kyoto, Japan
|
|
536
|
株式会社堀場エステック HORIBA STEC, CO., LTD.
|
〒601-8116京都府京都市南区上鳥羽鉾立町11- 5 1-5 Hokodate-cho Kamitoba, Minami-ku, Kyoto 601-8116
|
|
537
|
株式会社堀場製作所 HORIBA , LTD.
|
〒601-8510京都市南区吉祥院宮の東町2番地 2 Miyanohigashi, Kisshoin, Minami-ku, Kyoto 601-8510,Japan
|
|
538
|
株式会社堀場テクノサービス HORIBA TECHNO SERVICE CO., LTD.
|
〒601-8305京都府京都市南区吉祥院宮の東町2番地 2 Miyanohigashi, Kisshoin, Minami-ku, Kyoto 601-8305,Japan
|
|
539
|
本田技研工業株式会社 Honda Motor CO., LTD.
|
〒107-8556東京都港区南青山2丁目1-1 2-1-1 Minami-Aoyama Minato-ku, Tokyo 107-8556Japan
|
|
540
|
本多電子株式会社 HONDA ELECTRONICS CO., LTD.
|
〒愛知県豊橋市大岩町小山塚20 20 Oyamazuka, Oiwa-cho, Toyohashi, Aichi 441-3193Japan
|
|
541
|
株式会社ホンダトレーディング Honda Trading Corporation
|
〒107-8360東京都港区北青山一丁目2番3号 1-2-3 Kita-Aoyama, Minato-ku, Tokyo 107-8360 Japan
|
|
542
|
マイクロンメモリ ジャパン合同会社 Micron Memory Japan, G.K..
|
〒108-0075東京都港区港南1丁目2番70号 Konan 1-2-70, Minakto Ward, Tokyo
|
|
543
|
株式会社前川製作所 MAYEKAWA MFG.CO., LTD.
|
〒135-8482東京都江東区牡丹3-14-15 3-14-15, Botan, Koto-ku, Tokyo, 135-8482, Japan
|
|
544
|
株式会社牧野フライス製作所 Makino Milling Machine CO., LTD.
|
〒152-8578東京都目黒区中根2-3-19 3-19 Nakane 2-Chome Meguro-ku Tokyo 152-8578Japan
|
|
545
|
マクセル株式会社 Maxell,Ltd.
|
〒618-8525京都府乙訓郡大山崎町小泉一番地 Koizumi, Oyamazaki, Oyamazaki-cho ,Otokuni-gun,kyoto, 618-8525
|
|
546
|
株式会社マクニカ MACNICA, Inc.
|
〒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横浜一丁目6番地3 1-6-3 Shin-Yokohama kohoku-ku Yokohama, 222-8561
|
|
547
|
マクニカネットワークス株式会社 Macnica Networks Corp.
|
〒222-8562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横浜一丁目5番地5 1-5-5 Shin-Yokohama,Kouhoku-ku,Yokohama,222-8562
|
|
548
|
株式会社マグネスケール Magnescale Co.,Ltd
|
〒259-1146神奈川県伊勢原市鈴川45 45 Suzukawa, Isehara-shi, Kanagawa 259-1146,Japan
|
|
549
|
株式会社松浦機械製作所 Matsuura Machinery Corp.
|
〒910-8530福井県福井市漆原町市壱字沼壱番地 1-1, Urushibara-cho Fukui City 910-8530 Japan
|
|
550
|
マツダ株式会社 Mazda Motor Corp.
|
〒730-8670広島県安芸郡府中町新地3-1 3-1 Shinchi, Fuchu-cho, Aki-gun, Hiroshima 730-8670
|
|
551
|
株式会社マツボー Matsubo Corporation
|
〒105-0001東京都港区虎ノ門3-8-21 3-8-21, Toranomon, Minato-ku, Tokyo
|
|
552
|
松村石油株式会社 MATSUMURA OIL CO.,LTD
|
〒530-0047大阪市北区西天満2丁目8-5 2-8-5, Nishitenma, Kita-ku, Osaka, 530-0047 JAPAN
|
|
553
|
松本正株式会社 MATSUMOTOSHO CO., LTD.
|
〒541-0041大阪市中央区北浜1-9-10 9-10, 1Chome kitahama Chuo-ku Osaka Japan
|
|
554
|
株式会社マブチ・エスアンドティー MABUCHI S&T INC.
|
〒399-0497長野県上伊那郡辰野町樋口1365 1365 Higuchi, Tatsuno, Kamiina, Nagano, Japan 399-0422
|
|
555
|
マルツエレック株式会社 MARUTSU ELEC CO.LTD.
|
〒101-0021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5-2-2 セイキ第一ビル7F 5-2-2 Soto-Kanda, Chiyoda-Ku, Tokyo, 101-0021Japan
|
|
556
|
丸文株式会社 MARUBUN CORPRATION
|
〒103-8577東京都中央区日本橋大伝馬町8番1号 8-1, Nihonbashi Odenmacho, Chuo-ku, TOKYO 103-8577, Japan
|
|
557
|
丸紅株式会社 Marubeni Corp.
|
〒103-6060東京都中央区日本橋二丁目7番1号 東京日本橋タワー Tokyo Nihombashi Tower, 7-1, Nihonbashi 2-chome,Chuo-ku, Tokyo, 103-6060, Japan
|
|
558
|
丸紅エアロスぺース株式会社 Marubeni Aerospace Corporation
|
〒100-0006東京都千代田区有楽町一丁目1番3号 1-1-3,Yurakucho, Chiyoda-ku,Tokyo,Japan
|
|
559
|
丸紅ユティリティ・サービス株式会社 Marubeni Utility Services, Ltd.
|
〒100-0003東京都千代田区一ツ橋1-1-1 1-1, Hitotsubashi 1-chome Chiyoda-ku, Tokyo, 100-0003 Japan
|
|
560
|
ミカサ商事株式会社 MIKASA SHOJI CO.,LTD
|
〒540-0034大阪府大阪市中央区島町2-4-12 2-4-12 SHIMAMACHI CHUO-KU OSAKA 540-0034JAPAN
|
|
561
|
三木産業株式会社 Miki & CO., LTD.
|
〒東京都中央区日本橋3丁目15-5 No.15-5, 3-chome, Nihonbashi, Chuo-ku, Tokyo
|
|
562
|
ミクロ技研株式会社 MICRO ENGINEERING ING.
|
〒103-0026東京都中央区日本橋兜町15番12号 兜町MOCビル Kabutocho MOC Bldg, 15-12, Nihonbashi Kabuto-cho,Chuo-ku, Tokyo 103-0026 Japan
|
|
563
|
ミクロン精密株式会社 Micron Machinery CO., LTD.
|
〒990-2303山形県山形市蔵王上野578-2 578-2, Uwano, Zao, Yamagata 990-2303 , Japan
|
|
564
|
美津濃株式会社 Mizuno Corporation
|
〒559-8510大阪市住之江区南港北1丁目12番35号 1-12-35 Nanko Kita, Suminoe-ku, Osaka, Japan
|
|
565
|
三井造船システム技研株式会社 Mitsui Zosen Systems Research Inc.
|
〒261ー8501千葉県千葉市美浜区中瀬1丁目3番地 幕張テクノガーデンD9 MTG D-9f, 3-Banchi, 1-Chome, Nakase, Mihama-ku,Chiba, 261-8501, Japan
|
|
566
|
三井化学株式会社 Mitsui Chemicals, Inc.
|
〒105-7117東京都港区東新橋1-5-2 汐留シティセンター Shiodome City Center 1-5-2, Higashi-Shimbashi,Minato-ku, Tokyo 105-7117, Japan
|
|
567
|
三井精機工業株式会社 MITSUISEIKI KOGYO CO., LTD.
|
〒111-0052東京都台東区柳橋1-11-11 2nd Floor of Asakusabashi Yutaka High teck Bldg, 1-11-11 Yanagibashi Taito-ku, Tokyo 111-0052, Japan
|
|
568
|
三井倉庫サプライチェーンソリューション株式会社 MITSUI-SOKO Supply Chain Solutions, Inc.
|
〒105-0003東京都港区西新橋三丁目20番1号 3-20-1, Nishi-Shimbashi, Minato-Ku, Tokyo, 105-0003Japan
|
|
569
|
株式会社三井ハイテック Mitsui High-tec, Inc.
|
〒北九州市八幡西区小嶺2丁目10番1号 2-10-1, Komine, Yahatanishi-ku, Kitakyushu, 807-8588Japan
|
|
570
|
三井物産株式会社 MITSUI & CO., LTD.
|
〒100-8631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一丁目1番3号 1-3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631, Japan
|
|
571
|
三井物産エアロスペース株式会社 Mitsui Bussan Aerospace CO., LTD.
|
〒105-0011東京都港区芝公園2-4-1 秀和芝パークビル A館12階 Shuwa-Shiba Park Building A-12F 4-1, Shiba-Koen 2-chome, Minato-ku, Tokyo, 105-0011, Japan
|
|
572
|
三井物産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Mitsui Bussan Electronics Ltd.
|
〒105-0011東京都港区芝公園2-4-1 芝パークビルA館10階 Shiba Park Building A-10F, 4-1,Shibakoen 2-chome,Minato-ku, Tokyo 105-0011,Japan
|
|
573
|
三井物産プラスチック株式会社 MITSUI & CO.PLASTICS LTD.
|
〒100-6808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 1-3-1 JAビル JA Building, 3-1, Ohtemachi 1-Chome, Chiyoda-ku,Tokyo 100-6808 Japan
|
|
574
|
三井物産プラントシステム株式会社 Mitsui&Co.Plant Systems, LTD.
|
〒105-0021東京都港区東新橋1-9-2 9-2, Higashi-Shimbashi 1-Chome Minato-Ku, Tokyo105-0021 Japan
|
|
575
|
三井物産マシンテック株式会社 MITSUI &CO.MACHINE TECH LTD.
|
〒105-7134東京都港区東新橋1-5-2 汐留シティセンター34階 Shiodome City Center, 1-5-2 Higashi-shimbashi,Minato-Ku, Tokyo 105-7134
|
|
576
|
三井物産メタルズ株式会社 Mitsui Bussan Metals CO., LTD.
|
〒103-0028東京都中央区八重洲1丁目3番7号 八重洲ファーストフィナンシャルビル19・20階 19F・20F Yaesu First Financial Building, 3-7, Yaesu 1-Chome Chuo-ku, Tokyo, 103-0028, Japan
|
|
577
|
株式会社ミツトヨ Mitutoyo Corporation
|
〒213-8533神奈川県川崎市高津区坂戸1-20-1 20-1,Sakado 1-Chome,Takatsu-ku,Kawasaki-shi,Kanagawa 213-8533,Japan
|
|
578
|
三菱ケミカル株式会社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
|
〒100-8251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一丁目1番1号 1-1,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251, Japan
|
|
579
|
三菱自動車工業株式会社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
〒108-8410東京都港区芝浦三丁目1番21号 1-21, Shibaura 3-chome, Minato-ku, Tokyo 108-8410Japan
|
|
580
|
三菱重工機械システム株式会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chinerySystems,Ltd.
|
〒652-8585兵庫県神戸市兵庫区和田崎一丁目1番1号 1-1, Wadasaki-cho 1-chome,Hyogo-ku,Kobe 652-8585,JAPAN
|
|
581
|
三菱重工業株式会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
〒100-8332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三丁目2番3号 2-3, Marunouchi 3-Chome, Chiyoda-ku Tokyo, 100-8332, Japan
|
|
582
|
三菱重工工作機械株式会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CHINETOOL CO.,LTD.
|
〒520-3080滋賀県栗東市六地蔵130番地 130,Rokujizo,Ritto,Shiga,520-3080,JAPAN
|
|
583
|
三菱商事株式会社 Mitsubishi Corp.
|
〒100-8086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3-1 3-1, Marunou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8086, Japan
|
|
584
|
三菱商事RtMジャパン Mitsubishi Corporation RtM Japan Ltd.
|
〒100-7027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丁目7番2号 JPタワー27階 7-2, Marunouchi 2-chome, Chiyoda-ku, Tokyo, 100-7027, Japan
|
|
585
|
三菱商事テクノス株式会社 Mitsubishi Corp. Technos
|
〒108-0014東京都港区芝5丁目34番7号 新田町ビル Shin-Tamachi Bldg., 34-7, 5-Chome, Shiba, Minato-ku,Tokyo, Japan
|
|
586
|
三菱スペース・ソフトウエア株式会社 Mitsubishi Space Software CO., LTD.
|
〒105-6132東京都港区浜松町2-4-1 世界貿易センタービル32階 WTC Bldg.2-4-1 hamamatsu-chou, Minatoku, Tokyo,105-6132 Japan
|
|
587
|
三菱電機株式会社 Mitsubishi Electric Corp.
|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7-3 2-7-3, Marunouchi, Chiyodaku, Tokyo
|
|
588
|
三菱電機トレーディング株式会社 Mitsubishi Electric Trading Corp.
|
〒100-0005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1-1 2-1-1, Marunouchi, Chiyodaku, , Tokyo Japan
|
|
589
|
三菱日立パワーシステムズ株式会社 MITSUBISHI HITACHI P0WER SYSTEMS, LTD.
|
〒220-8401神奈川県横浜市西区みなとみらい三丁目3番1号 3-1, Minatomirai 3-Chome, Nishi-ku, Yokohama,Kanagawa, 220-8401, Japan
|
|
590
|
三菱ふそうトラック・バス株式会社 Mitsubishi Fuso Truck and Bus Corporation
|
〒211-8522神奈川県川崎市中原区大倉町10番地 10 Ohkura-cho, Nakahara-ku, Kawasaki-shi,Kanagawa, 211-8522 Japan
|
|
591
|
三菱プレシジョン株式会社 Mitsubishi Precision Company, Limited
|
〒135-0063東京都江東区有明3-5-7
|
|
592
|
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 MITSUBISHI MATERIALS Corp.
|
〒100-8117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一丁目3番2号 1-3-2, OHTEMACHI, CHIYODA-KU, TOKYO 100-8117,Japan
|
|
593
|
ニチユ三菱フォークリフト株式会社 Mitsubishi Nichiyu Forklift Co., Ltd.
|
〒617-8585京都府長岡京市東神足2丁目1番1号 1-1, 2-Chome Higashikotari, Nagaokakyo-shi, Kyoto617-8585 Japan
|
|
594
|
三ツ矢貿易株式会社 Mitsuya Boeki LTD.
|
〒大阪市中央区久太郎町2-2ー7 2-2-7 Kyutaro-Machi, Chuo-Ku, Osaka, Japan
|
|
595
|
ミネベアミツミ株式会社 MinebeaMitsumi Inc.
|
〒389-0293長野県北佐久郡御代田町大字御代田4106-73 4106-73 Oaza Miyota, Miyota-machi, Kitasaku-gun,Nagano 389-0293
|
|
596
|
株式会社ミラプロ MIRAPRO CO., LTD.
|
〒408-0111山梨県北杜市須玉町穴平1100番地 1100 Anadaira, Sutama-cho, Hokuto-city, Yamanashi408-0111 Japan
|
|
597
|
村田機械株式会社 Murata Machinery, LTD.
|
〒601-8326京都市南区吉祥院南落合町3番地 3, Minamiochiai-cho, Kisshoin, Minami-ku, Kyoto 601-8326 Japan
|
|
598
|
株式会社村田製作所 Murata Manufacturing CO., LTD.
|
〒617-8555京都府長岡京市東神足1-10-1 10-1, Higashikotari 1-chome, Nagaokakyo-shi, Kyoto617-8555 Japan
|
|
599
|
株式会社 明電舎 MEIDENSHA CORPORATION
|
〒141-6029東京都品川区大崎 2-1-1 ThinkPark Tower ThinkPark Tower, 2-1-1 Osaki, Shinagawa-ku, Tokyo141-6029, Japan
|
|
600
|
株式会社メタルワン Metal One Corporation
|
〒100-7032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2-7-2 JPタワー JP Tower,2-7-2,Marunouchi,Chiyoda-ku,Tokyo,100-7032,Japan
|
|
601
|
メトロン技研株式会社 Metron Technology Research
|
〒530-0003大阪市北区堂島1-2-5 堂北ダイビル5F 1-2-5 Dojima Kita-ku Osaka-shi 530-0003 Japan
|
|
602
|
メルク株式会社 Merck LTD.
|
〒153-8927東京都目黒区下目黒1-8-1アルコタワー5階 Arco Tower 5F, 1-8-1 Shimomeguro, Meguro-ku, Tokyo153-8927 Japan.
|
|
603
|
メルダスシステム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MELDAS SYSTEM ENGINEERINGCORPORATION
|
〒461-0004愛知県名古屋市東区葵一丁目19番30号 1-19-30 Aoi,Higashiku,Nagoya-City,Aichi,461-0004Japan
|
|
604
|
メンター・グラフィックス・ジャパン株式会社 Mentor Graphics Japan Co LTD.
|
〒東京都品川区北品川4丁目7番35号 御殿山ガーデン Gotenyama Garden 4-7-35 KitashinagawaShinagawaku Tokyo
|
|
605
|
モトローラ・ソリューションズ株式会社 Motorola Solutions Japan Ltd.
|
〒108-0023東京都港区芝浦四丁目6番8号 4-6-8 Shibaura, Minato-ku, Tokyo 108-0023 Japan
|
|
606
|
森村商事株式会社 Morimura Bros.,Inc.
|
〒105-8451東京都港区虎ノ門 1丁目3番1号 森村ビル 3-1 Toranomon 1-Chome Minato-ku Tokyo 105-8451Japan
|
|
607
|
森六ケミカルズ株式会社 MORIROKU CHEMICALS Co., Ltd.
|
〒107-0062東京都港区南青山一丁目1番1号 1-1-1 Minamiaoyama Minato-ku Tokyo, Japan 107-0062
|
|
608
|
安川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YASKAWA ELECTRIC ENGINEERINGCORPORATION
|
〒802-0003北九州市小倉北区米町1-2-26 1-2-26 Komemachi,Kokurakita-ku,Kitakyusyu 802-0003Japan
|
|
609
|
安川オートメーション・ドライブ株式会社 Yaskawa Automation & Drives Corp.
|
〒141-0032東京都品川区大崎1丁目11番1号 ゲートシティ大崎ウエストタワー7階 Gate City Ohsaki west tower 7F, 1-11-1, OsakiShinagawa-ku, Tokyo
|
|
610
|
株式会社安川電機 Yaskawa Electric Corp.
|
〒806-0004福岡県北九州市八幡西区黒崎城石2-1 2-1, Kurosaki-shiroishi, Yahatanishi-ku, Kitakyushu 806-0004, Japan
|
|
611
|
株式会社安川ロジステック YASKAWA LOGISTEC CORP.
|
〒北九州市小倉北区米町1-1-21 1-1-21 Komemachi, Kokura-Kita-Ku, Kitakyuusyuu,Japan
|
|
612
|
安田産業株式会社 YASUDA SANGYO CO., LTD.
|
〒541-0059大阪府大阪市中央区博労町1丁目6番2号 6-2 Bakuromachi 1-chome Chuo-ku, Osaka 541-0059,Japan
|
|
613
|
株式会社ヤナギサワ YANAGISAWA CO., LTD.
|
〒108-0073東京都港区三田2-17-26 2-17-26 MITA MINATO-KU TOKYO 108-0073
|
|
614
|
ヤマザキマザック株式会社 YAMAZAKI MAZAK Corp.
|
〒480-0197愛知県丹羽郡大口町竹田1-131 1-131Takeda, Oguchi-cho, Niwa-gun, Aichi pref.Japan
|
|
615
|
株式会社ヤマダコーポレーション YAMADA CORPORATION
|
〒143-8504東京都大田区南馬込1-1-3 NO. 1-3, 1-CHOME, MINAMIMAGOME, OHTA-KUTOKYO 143-8504
|
|
616
|
ヤマハ株式会社 YAMAHA CORPORATION
|
〒430-8650静岡県浜松市中区中沢町10-1 10-1,Nakazawa-cho,Naka-ku,Hamamatsu,Shizuoka430-8650,Japan
|
|
617
|
ヤマハ発動機株式会社 YAMAHA MOTOR CO., LTD.
|
〒438-8501静岡県磐田市新貝2500番地 2500 Shingai, Iwata, Shizuoka 438-8501, Japan
|
|
618
|
ヤマハモーター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YAMAHA MOTOR ELECTRONICS CO., LTD.
|
〒静岡県周智郡森町森1450-6 1450-6 Mori Mori-machi Shuchi-gun Shizuoka
|
|
619
|
ヤマハモーターエンジニアリング株式会社 YAMAHA MOTOR ENGINEERING CO., LTD.
|
〒438-0026静岡県磐田市西貝塚3622番地の8 3622-8 Nishikaizuka, Iwata, Shizuoka 438-0026, Japan
|
|
620
|
ヤマハモーターソリューション株式会社 YAMAHA MOTOR SOLUTIONS CO., LTD.
|
〒静岡県磐田市岩井2000番地の1 2000-1 Iwata, Shizuoka Japan
|
|
621
|
ヤマハモーターパワープロダクツ株式会社 YAMAHA MOTOR POWERED PRODUCTSCO, .LTD.
|
〒436-0084静岡県掛川市逆川200-1 200-1 Sakagawa, Kakegawa, Shizuoka 436-0084,Japan
|
|
622
|
ヤンマー株式会社 YANMAR CO.,LTD.
|
〒530-8311大阪市北区茶屋町1番32号 1-32, Chayamachi, Kita-ku, Osaka 530-8311, Japan
|
|
623
|
ユアサ商事株式会社 Yuasa Trading CO., LTD.
|
〒103-8570東京都中央区日本橋大伝馬町13-10 103-8570 13-10, Nihonbashi-Odenmacho, chuo-ku,Tokyo
|
|
624
|
株式会社UKCエレクトロニクス UKC Electronics Corporation
|
〒141-0032東京都品川区大崎 1-11-2 ゲートシティ大崎 Gate City Ohsaki, East Tower, 1-11-2 Osaki,Shinagawa-ku, Tokyo, 141-0032 Japan
|
|
625
|
有人宇宙システム株式会社 Japan Manned Space Systems Corp.
|
〒100-0004東京都千代田区大手町1丁目6番1号 大手町ビル Otemachi Bldg., 1-6-1, Otemachi, Chiyoda-ku, Tokyo100-0004, Japan
|
|
626
|
ユニチカ株式会社 UNITIKA Ltd.
|
〒541-8566大阪府大阪市中央区久太郎町四丁目1番3号 Osaka Center Bldg., 4-1-3 Kyutaro-machi, Chuo-ku,Osaka, 5418566 Japan
|
|
627
|
株式会社ユビテック Ubiteq, Inc.
|
〒106-0047東京都港区南麻布三丁目20番1号 3-20-1 Minamiazabu,Minato-ku,Tokyo 106-0047 Japan
|
|
628
|
株式会社 ヨコオ yokowo co,,ltd.
|
〒114-8515東京都北区滝野川7-5-11 7-5-11 Takinogawa Kita-ku Tokyo Japan
|
|
629
|
横河計測株式会社 Yokogawa Test & MeasurementCorporation
|
〒180-8750東京都武蔵野市中町二丁目9番32号 2-9-32 Nakacho,Musashino-shi,Tokyo,180-8750 Japan
|
|
630
|
横河電機株式会社 Yokogawa Electric Corp.
|
〒180-8750東京都武蔵野市中町2-9-32 2-9-32 Nakacho Musashino-shi, Tokyo, 180-8750,Japan
|
|
631
|
横河電子機器株式会社 Yokogawa Denshikiki Co., Ltd.
|
〒151-0051東京都渋谷区千駄ヶ谷5-23-13 南新宿星野ビル Minami Shinjyuku Hoshino Bldg. 5-23-13Sendagaya,Shibuyaku,Tokyo,151-0051,Japan
|
|
632
|
横河レンタ・リース株式会社 Yokogawa Rental & Lease Corp.
|
〒160-0023東京都新宿区西新宿1-23-7 新宿ファーストウエスト Shinjuku First West 1-23-7 Nishi-Shinjuku, Shinjuku-ku,Tokyo, 160-0023 Japan
|
|
633
|
リーダー電子株式会社 Leader Electronics Corp.
|
〒223-8505横浜市港北区綱島東2丁目6番33号 2-6-33 Tsunashima Higashi Kohokuku YokohamaJapan 223-8505
|
|
634
|
国立研究開発法人 理化学研究所 RIKEN
|
〒351-0198埼玉県和光市広沢2番1号 2-1 Hirosawa, Wako, Saitama 351-0198
|
|
635
|
株式会社リガク Rigaku Corp.
|
〒196-8666東京都昭島市松原町3-9-12 3-9-12, Matsubara-cho, Akishima-shi, Tokyo 196-8666,Japan
|
|
636
|
理研計器株式会社 RIKEN KEIKI CO., LTD.
|
〒東京都板橋区小豆沢2-7-6 2-7-6 AZUSAWA ITABASHI-KU TOKYO
|
|
637
|
株式会社リコー Ricoh Company, LTD.
|
〒143-8555東京都大田区中馬込1-3-6 3-6, Nakamagome 1-chome, Ohta-ku, Tokyo 143-8555, Japan
|
|
638
|
リコーインダストリー株式会社 RICOH Industry Co.,Ltd.
|
〒243-0298神奈川県厚木市下荻野 1005 1005 Shimoogino,Atsugi-si,Kanagawa 243-0298,Japan
|
|
639
|
リコーテクノロジーズ株式会社 Ricoh Technologies CO.,LTD.
|
〒243-0460神奈川県海老名市泉二丁目7番1号 2-7-1,Izumi,Ebina-City,Kanagawa-Pref.,243-0460Japan
|
|
640
|
リコー電子デバイス株式会社 RICOH Electronic Devices Co.,Ltd.
|
〒563-8501大阪府池田市姫室町13-1 13-1,Himemuro-cho,Ikeda-city Osaka 563-8501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