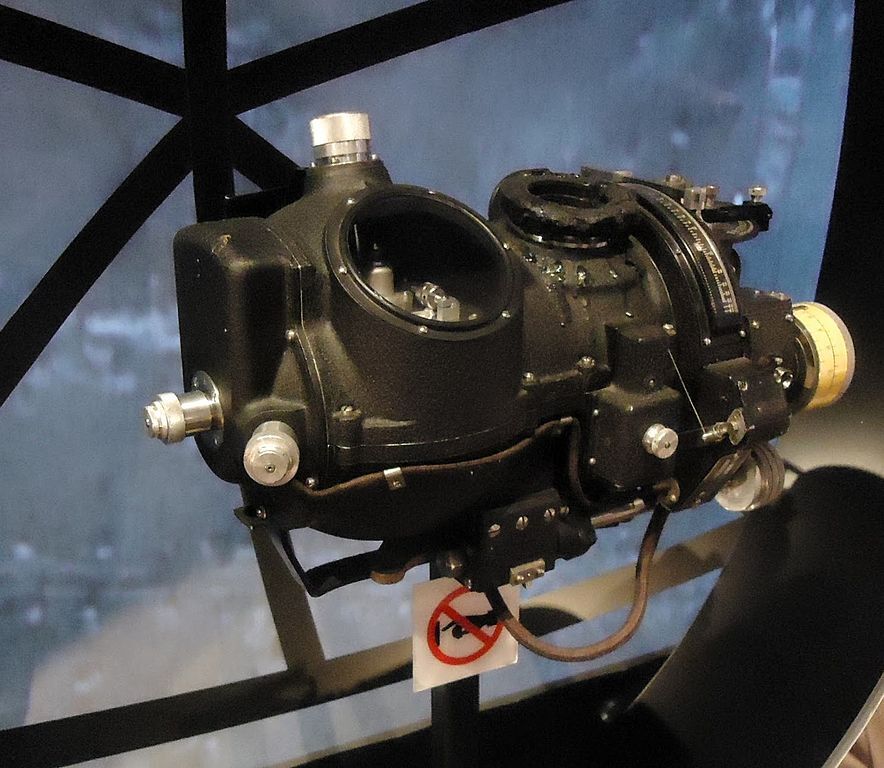비상탈출하는 조종사를 공격하는 것은 범죄행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네덜란드 수복작전인 마켓 가든 작전(Operation Market Garden)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머나먼 다리(A Bridge Too Far)”를 보면 미군 제101공수사단의 부대원들이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도중에 독일군의 사격으로 무수히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군용기에서 비상탈출하는 조종사를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범죄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1977년 6월 8일 제네바협약에 추가된 제1의정서의 내용에는
1. 조난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하강 중인 자는 공격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조난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하강 중인 자는 적대국의 영토 내에 착륙하여 명백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항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공수부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명은 귀중한 것이지만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도 항공기에서 벗어난 조종사는 전투원이 아닌 비전투원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미군의 “지상전교범2-10”에서도 비행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는 비전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규정과 교범이 마련되기 전인 2차 대전 당시에 이와 관련한 “찰리 브라운과 프란츠 스티글러 사건(Charlie Brown and Franz Stigler incident)”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적으로 만났던 미국과 독일의 조종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끝난 후 4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2008년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을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3년 12월 20일 찰스 브라운(harles “Charlie” Brown)은 B-17폭격기를 조종하여 독일의 브레멘 인근에 있는 포케불프(Focke-Wulf) 제조공장을 폭격하러 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조종사 프란츠 스티글러(Franz Stigler)는 메서슈미트(Messerschmitt)Bf-109를 몰고 이를 격추시키러 출동하게 됩니다.
드디어 프란츠 스티글러(Franz Stigler)는 찰스 브라운(harles “Charlie” Brown)이 조종하는 B-17폭격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격추하게 되면 그날 이미 2대의 B-17을 격추시킨 전과를 올리고 있던 프란츠 스티글러(Franz Stigler)는 독일의 “기사십자 철십자장(Knight’s Cross)”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프란츠 스티글러(Franz Stigler)는 B-17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운의 B-17이 이미 대공포의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고,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들도 상태가 좋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훈시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령관 구스타브 뢰델(Gustav Rödel)은 “자네는 처음도 전투기 조종사고 마지막도 전투기 조종사다. 그런 자네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을 쏘는 것을 보게 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음을 듣게 된다면 내가 자네를 쏠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글러는 공격을 하는 대신에 브라운에게 착륙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브라운이 거절함에 따라 스티글러는 브라운의 비행기가 무사히 중립지역인 스웨덴으로 갈 수 있도록 독일 영공에서 B-17을 호위해줍니다.
그러나 서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운은 중립지대인 스웨덴이 아닌 기지가 있는 영국의 시싱비행장(Royal Air Force station Seething)으로 비행기를 몰았고 북해의 해안에서 스티글러는 브라운에게 경례를 하고 돌아갑니다.
스티글러의 배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기지로 귀환한 브라운은 전쟁이 끝나고 캐나다에 이주하여 살고 있던 스티글러를 1990년에 극적으로 다시 만나 감사를 전하고 둘은 우정을 나누다가 2008년 심장마비로 3월 22일 스티글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후 11월 24일에 브라운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브라운, 왼쪽이 스티글러, 가운데는 화가 보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