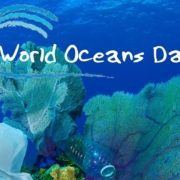암스테르담의 플라스틱 피싱 투어
함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줄이고자 각국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2017년 11월 4일 KBS의 인터넷 기사에서 “척박한 도시의 삶 바꾸는 전 세계 착한 실험”이란 제목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사회적 기업 “플라스틱 웨일(Plastic Whale)”은 암스테르담 운하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모아 보트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보트를 타고 운하로 나가 다시 쓰레기를 줍고, 일정량이 모이면 새로운 보트를 만드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리우스 스미트 (Marius Smit)란 사람이 설립한 이 사회적 기업은 이제는 영역을 확대하여 디자인 회사인 LAMA Concept의 도움을 받아 책상이나 의자를 비롯한 사무용 집기와 램프와 음향패널 등을 만들고 가구 제조업체인 Vepa에서는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피싱 투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관광하면서 간단한 스낵과 함께 운하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환경보호에 동참하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원화로 3만 원 정도하는 참가비를 내면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 운하를 관광하면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수거한 폐플라스틱은 다시 보트나 기타 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를 한다고 하며, 2010년에 설립된 “플라스틱 웨일(Plastic Whale)”은 약 5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 용기와 10톤 이상의 다른 쓰레기들을 수거하였다고 합니다.
마리우스 스미트 (Marius Smit)는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웨일(Plastic Whale)”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즉, 모든 인류가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이루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스케이트 보드 등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웨일(Plastic Whale)”이 진행하는 “플라스틱 피싱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환경보호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