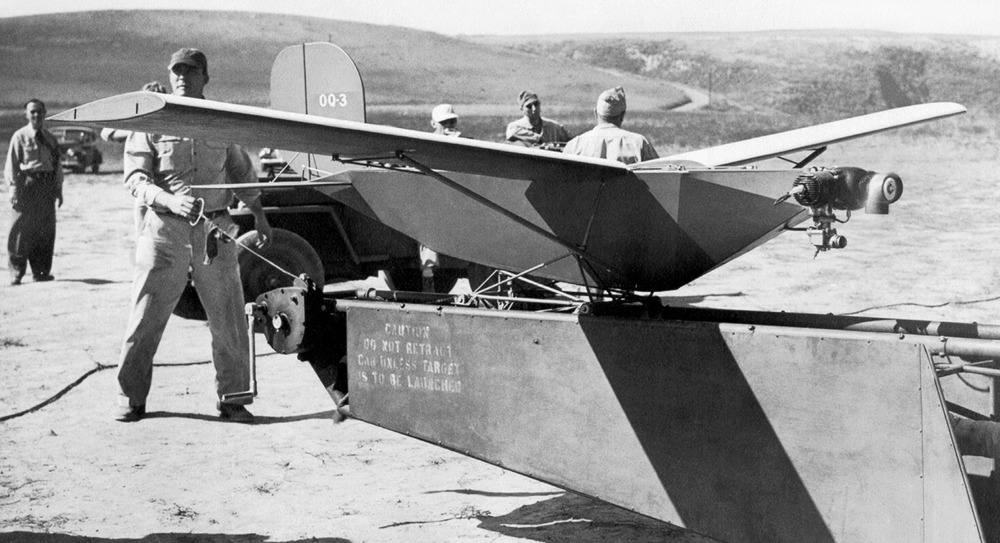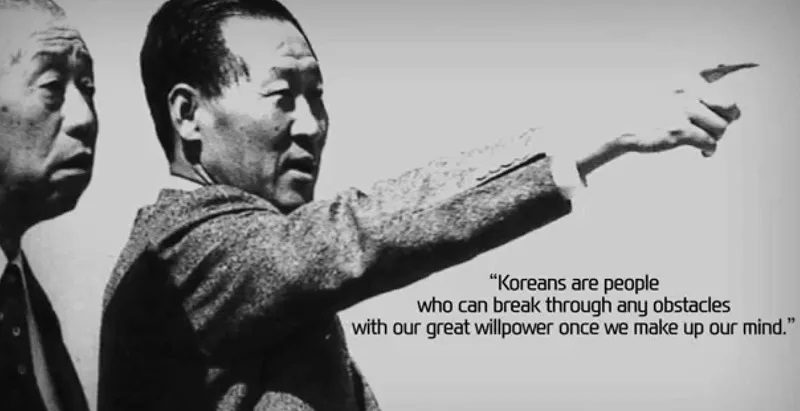19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최악의 붕괴사고 Top 6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개발에 참여한 라오스의 수력발전댐 붕괴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과 실종자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제국의 최대규모의 전차경기장이었던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는 “안토니우스 피누스”황제 재임 시에 붕괴되어 1만 3천여 명이 희생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인명사고를 낸 것은 로마 교외의 피데나이(Fidenae)에 있던 목재로 건축된 원형극장이 붕괴되어 2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만 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이 가장 많은 인명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1800년대에 일어난 사고로는 1807년 9월 20일(음력 8월 19일)에 발생한 일본의 영대교(永代橋) 붕괴사고를 꼽을 수 있는데 토미오카하치만구(富岡八幡宮)의 신사에 몰려든 참배객들로 인해 노후화된 교량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1,400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후 교량은 1926년에 현재의 철교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1889년 5월 31일에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를 강타한 폭풍우로 사우스포크댐의 강물이 범람하면서 댐이 무너져 2,20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1900년대에 이후에는 인류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사고가 일어납니다.
1900년대 이후에 발생한 붕괴사고에는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이름도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가장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은 최악의 붕괴사고 Top6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6위: 1959년 프랑스 말파셋 댐(Malpasset Dam) 붕괴사고
1952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54년 4월에 완공된 이 댐은 1959년 12월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421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사고의 원인으로는 하류의 단층으로 인해 댐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건설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부실한 지질조사가 불러온 인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5위: 1995년 한국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설계의 부실, 시공의 부실 등 모든 부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고는 6·25전쟁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재로 기록되고 있으며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이라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 4위: 1928년 미국의 세인트 프랜시스 댐(St. Francis Dam) 붕괴사고
토지개발붐이 한창이던 1924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26년에 완공된 이 댐은 물을 채울 때부터 균열이 발견되었고 그 후에도 균열과 누수가 발견되었으며 1928년 3월 12일에 댐을 설계한 윌리엄 멀홀랜드가 정기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균열의 보고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 몇 시간 뒤에 붕괴되어 432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3위: 2013년 방글라데시의 다카 근교 건물 붕괴사고
아직도 이 사고는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데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 근교에 있는 8층으로 된 상업용 건물인 “라나 플라자”가 붕괴되어 1,1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다국적 패션기업들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2위: 1963년 이탈리아의 바이온트 댐(Vajont Dam or Vaiont Dam) 붕괴사고
1960년에 준공된 이 댐은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 부흥의 상징이었으며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이었는데 1963년의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때문에 댐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10월 9일 밤 10시 39분에 댐 좌측의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로 2억6천만㎡의 토사가 댐에 빠른 속도로(시속 109km)로 흘러들어 거대한 해일이 발생하였고 이 해일이 마을을 덮치면서 2,125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 1위: 1975년 중국의 반차오 댐(Banqiao Dam) 붕괴사고
1949년과 1950년에 연속해서 발생한 회하(淮河)의 홍수로 인한 하천공사의 일환으로 1952년에 완공된 이 댐은 1975년 태풍 “니나(Nina)”로 인해 붕괴되었는데, 당시 반차오 댐을 비롯하여 58개의 중소형 댐들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홍수가 민가를 덮치는 바람에 익사자를 포함하여 전염병과 기아로 인한 2차 사망자의 숫자를 모두 합해 17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2005년에서야 중국정부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지만 공개한 정보도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업무상 방문한 북경지역의 고층건물 건설현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 육안으로 느껴질 정도의 부실한 현장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최소한 부실로 인하여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