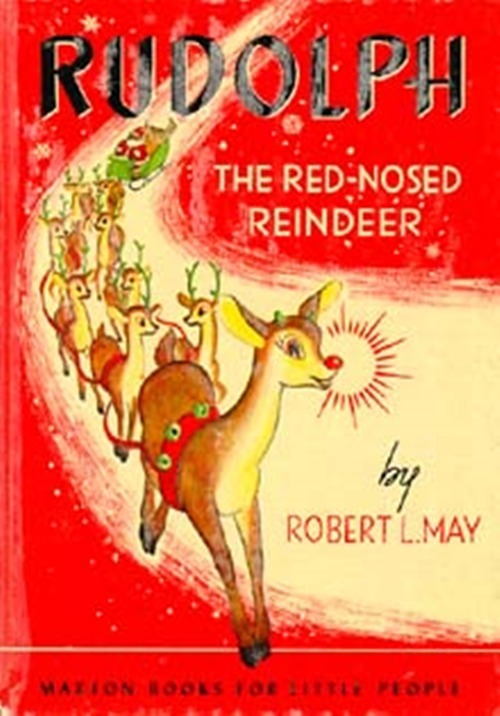캐나다 국기에는 언제부터 단풍잎을 그려 넣었을까?
태평양이 보이는 밴쿠버에서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퀘벡의 몽졸리에 이르기까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깨끗하다. 아름답다.”는 것이 제가 가지는 캐나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국기에는 상징과도 같은 단풍잎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은 언제부터 캐나다의 국기에 단풍잎 그림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34년 프랑스인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에 의해 발견되어 당시 원주민들이 부르던 호칭(카나타: 마을이란 뜻)을 따라 캐나다로 부른 것이 국명의 유래인 캐나다는 카르티에가 이 땅이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 만든 아래와 같은 모양인 당시의 프랑스기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프랑스인들이 누벨 프랑스(뉴 프랑스)라고 부르며 건너와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들이 조직한 길드사무소에서는 당시 프랑스의 해군기를 게양하였었는데 1663년 루이 14세가 누벨 프랑스를 국왕의 직할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루이 14세의 깃발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영국인들도 캐나다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프랑스 상인들과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영토분쟁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앤여왕전쟁’ ‘조지왕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프랑스의 식민지 거점이었던 퀘벡이 함락되고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표면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인구는 프랑스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1841년에 영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어퍼 캐나다(Upper Canada)와 프랑스계가 많은 로어 캐나다(Lower Canada)를 통합하기 위해 ‘연합 캐나다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유니온 잭을 국기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4년 ‘퀘벡결의’를 채택하여 “캐나다를 구성하는 주는 캐나다연방의 식민지이며, 캐나다연방은 영국의 식민지”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구조가 반영된 깃발을 1867년부터 국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의 깃발을 보면 왼쪽 위에 유니온 잭이 자리하고 있고 그 오른편 아래에 있는 것이 당시의 캐나다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4개의 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좌측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 브런즈윅 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를 나타내는 문양을 보면 단풍잎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부터 캐나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단풍잎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 데에는 1848년도에 여러 언론에서 캐나다의 상징으로 단풍잎을 규정하는 기사들이 있었고, 1860년에 창설한 제100연대의 마크에 단풍잎을 그리는 등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알렉산더 뮤어(Alexander Muir)가 1867년에 만든 “단풍잎이여 영원하라.(The Maple Leaf forever)”라는 노래이며 이 노래는 당시 캐나다의 국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국기에는 더 많은 주를 표기하게 되었으나 너무 복잡함에 따라서 단순화 시키고 하단에 녹색의 단풍잎을 그려 넣은 깃발이 1921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1907년 제정
1921년 제정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캐나다는 영국연방의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깃발을 사용했는데 프랑스계의 반발 때문에 백합문양의 “플뢰르 드 리스(fleur de lis)”를 함께 그려 넣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부터 미국과의 군사적·경제적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도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총리의 임면권과 국회의 소집 및 해산권을 이양 받게 되는데 이 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캐나다의 독립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45년에 당시의 총리였던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William Lyon Mackenzie King)이 아래와 같이 황금 단풍잎이 그려진 디자인을 국기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프랑스계의 반발로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 후 다시 제정된 국기는 1921년에 만들어진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단풍잎의 색깔만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새로운 국기의 제정을 바라고 그 중의 60%는 단풍잎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당시 야당인 자유당의 지도자였던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이 “하루빨리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963년에 캐나다의 제14대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국기를 고안했는데 왼쪽의 파란색은 태평양을 상징하고 오른쪽의 파란색은 대서양을 상징하며 가운데의 단풍잎은 캐나다인과 영토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많은 반발을 낳고 말았습니다.(언론 유출 이후 1964년 6월 15일에 국회심의에 회부함)
특히 야당에서 “반드시 유니온 잭을 넣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역사학자 조지 스탠리가 제안하고 캐나다 왕립군사대학이 디자인한 아래와 같은 것을 국기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 1964년 9월 10일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결정하기로 의결하고 여야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5회의 심의를 거듭한 끝에 유니온 잭과 백합문양을 빼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1964년 12월 15일 국회에서 투표를 하여 찬성 163대 반대 78표로 통과함으로써 아래의 디자인이 정식국기로 제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