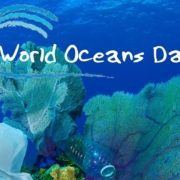백제(百濟)의 낚시왕 경중(慶仲)
사진은 백제왕씨(百済王氏)의 선조를 모시는 백제왕신사
언젠가 낚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와 술을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나는 그분에게 “생산하는 제품의 좋고 나쁨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지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제품에 대한 개발사를 연대기(年代記)로 만들어 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낚시문화는 근대화가 일본보다 늦었고,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의 낚시용품과 문화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낚시용품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낚시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내 낚시용품 제조사들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07년에 낚시춘추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당시 한국다이와의 대표이사였던 아베 코이치씨가 했던 “한국 조구업체는 단순히 경쟁사보다 한두 가지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참돔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채비로 타이라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낚시방법의 하나로 일본의 세토시에서 유래하여 널리 퍼진 것이고, 이외에도 아키타에서는 지렁이를 사용하여 참돔을 잡는 낚시를 많이 하고 있고 지바현 남서쪽의 태평양에 면한 소토보에서는 텐야낚시를 많이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납자루낚시란 것이 있는데 납자루의 일본어는 타나고(タナゴ)이며 납자루를 잡는 낚시를 가리켜 타나고낚시(タナゴ釣り)라고 한다.
그런데 짧은 연질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이 낚시법의 유래를 살펴보면 일본 에도시대의 생활문화가 고스라니 숨어있음을 알게 된다.
에도시대에는 화재가 빈번하였던 관계로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운하에 목재를 띄워놓은 목장(木場)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 밑에 납자루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낚싯대가 아닌 장대 끝에 갈고리를 달아 납자루를 잡았던 것이 바로 타나고낚시(タナゴ釣り)의 기원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맞게 개발된 낚시방법들이 우리의 실정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멀리한 채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국내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낚시방법들은 일본의 낚시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본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기가 되겠지만, 이를 선도하지 못하는 국내 관련기업들은 고작해야 그들의 뒤를 쫓는 제품의 생산에만 급급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섬나라란 지정학적 요건으로 인해 낚시가 성행하고 관련산업이 성장한 측면도 있을 것이나 그 이면에는 낚시에 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를 꽃피우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번역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낚시 전문서인 가센로쿠(何羨録)도 1723년에야 세상에 선을 보였는데 책의 본문 중에서 추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바닥이 둥근 것은 장대낚시 용으로 적합하고 바닥의 면이 평평한 것은 배낚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같이 낚시와 관련하여 역사적 자료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역사적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여 보존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오래전부터 추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낚시역사에 있어서 660년에 멸망한 백제(百濟)라는 국가에 나는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飛鳥寺)도 588년에 백제의 승려와 기술자들이 건너가서 창건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 끼친 문화적인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아스카데라(飛鳥寺)
또한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善光)은 그대로 일본에 남아 일본의 구다라노코니키시씨란 씨족의 선조가 되는데 구다라노코니키시씨의 한자표기는 백제왕씨(百済王氏)이다.
그런데 선광(善光)의 6대손인 경중(慶仲: 일본어 케이츄)이란 사람이 낚시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중(慶仲)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판 위키피디아에는 “낚시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과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들이 오직 경중의 바늘만 삼킬 뿐이어서 순식간에 백여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국내 낚시인들이 즐겨 찾던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며, 차제에 일본의 낚시용품에 대하여 그것을 추월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국내실정에 맞는 제품의 개발로 우리의 낚시문화를 새롭게 개척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따라주기를 희망해본다.
많은 낚시인들의 자발적인 국내용품 사용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중지함과 아울러 제품의 개발사와 이면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기업의 디테일한 노력도 함께 따라주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