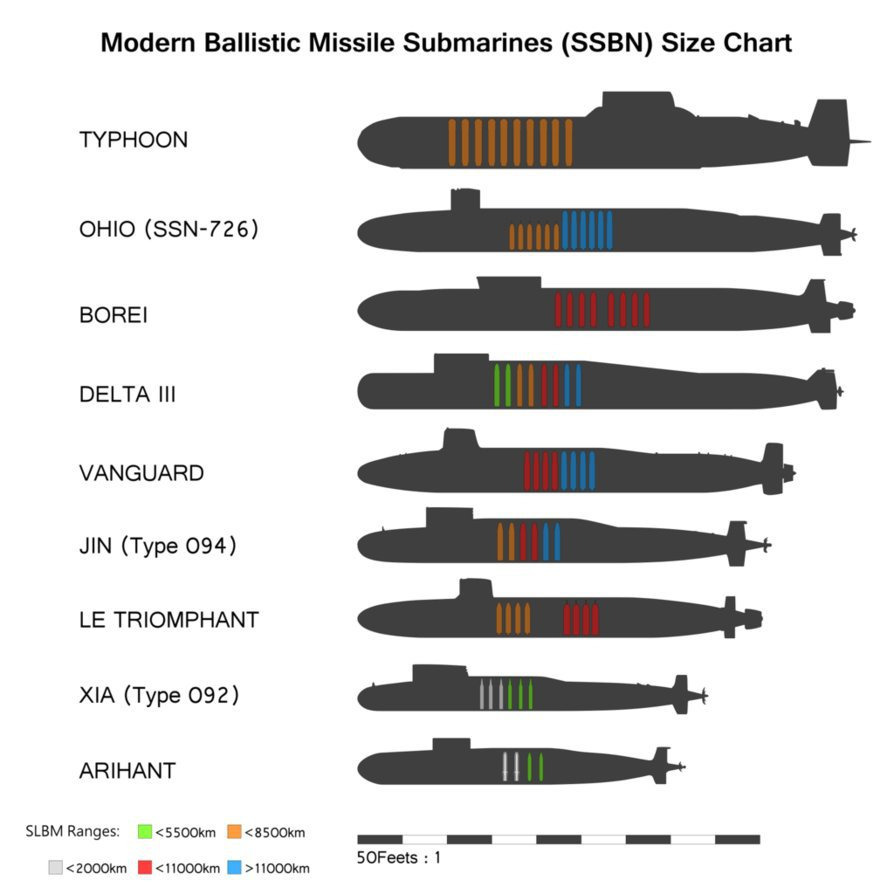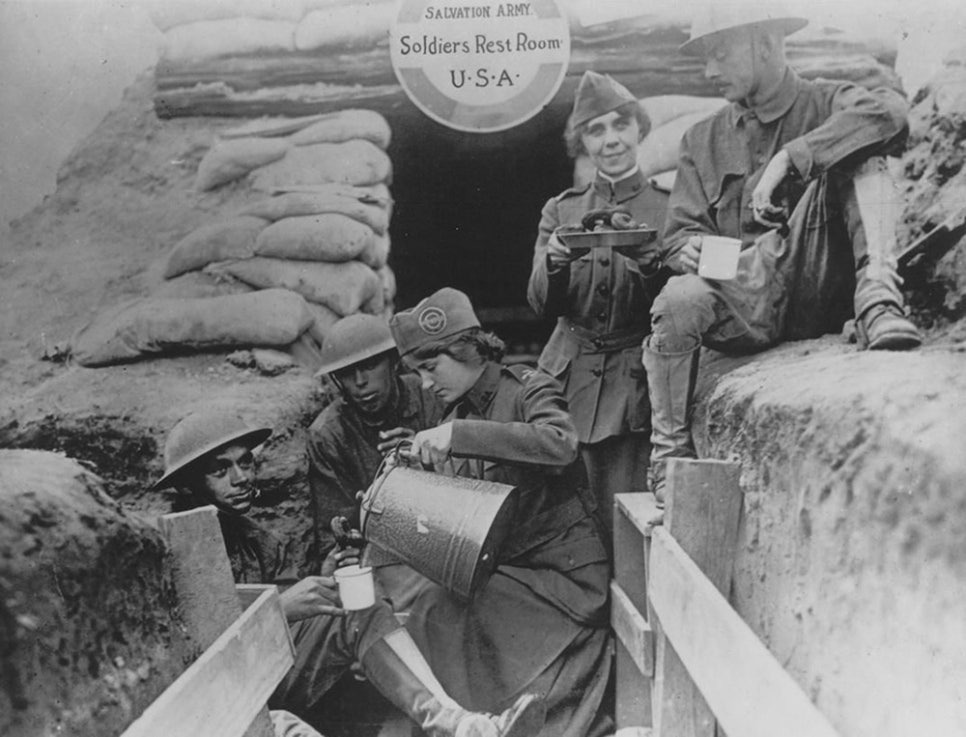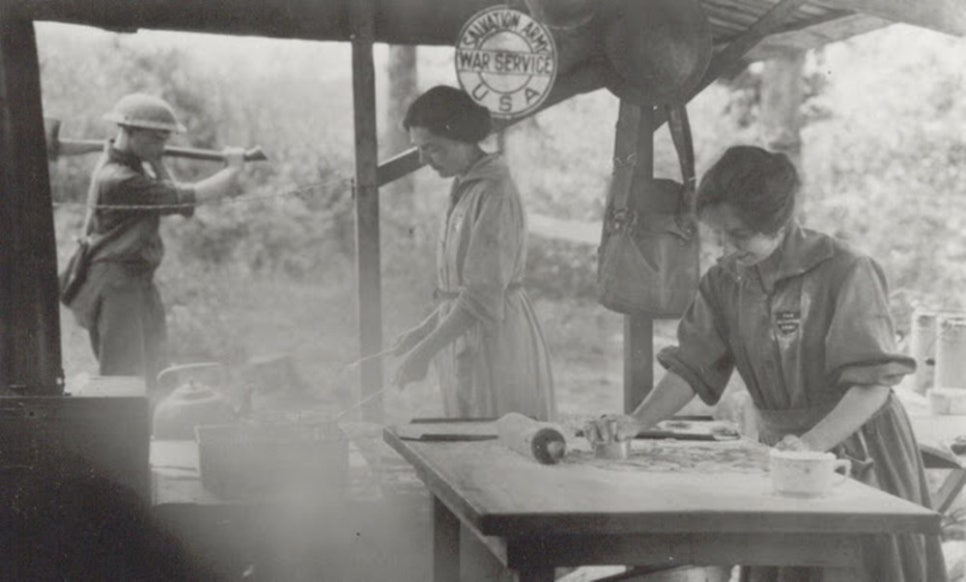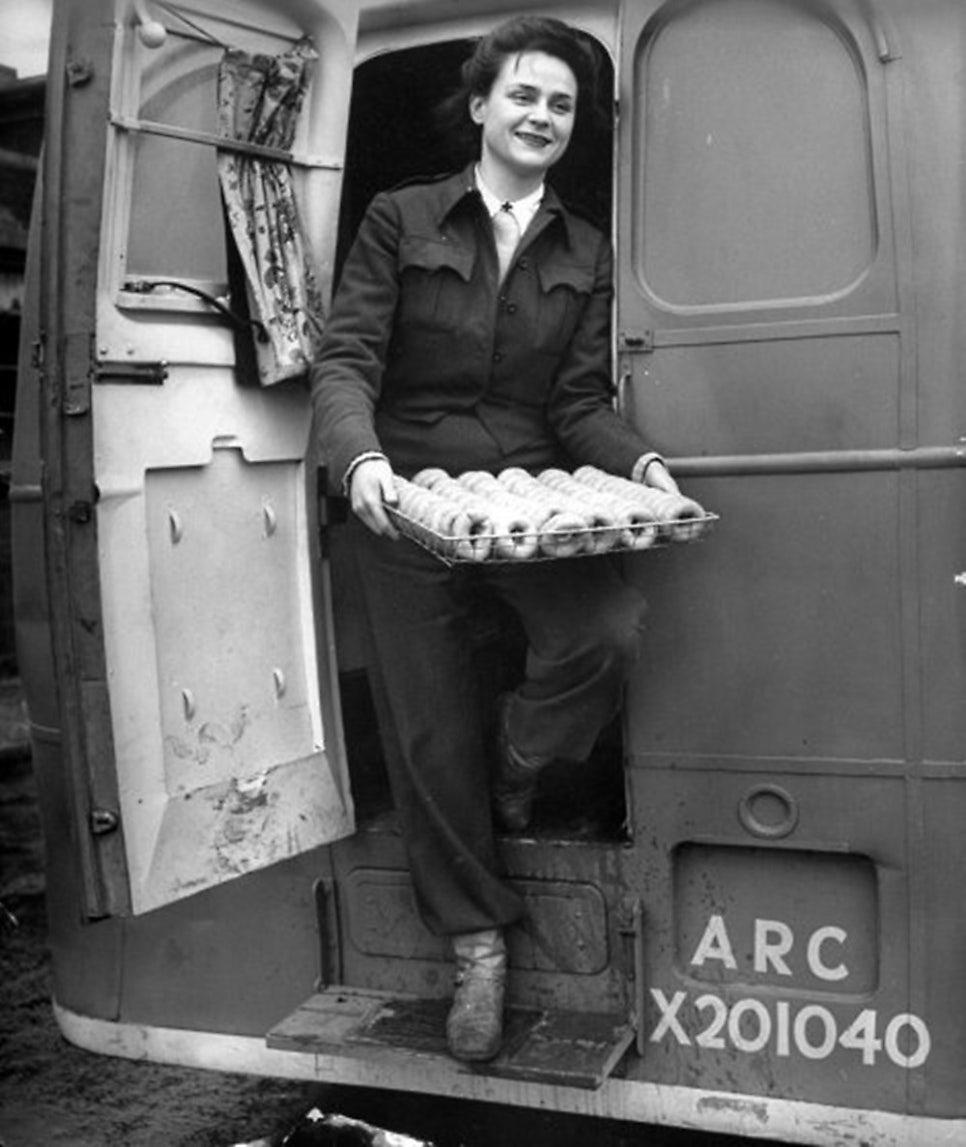아우슈비츠의 여성 도살자들
사진은 아우슈비츠와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에서 근무하면서 인체실험을 실시했던 독일의 헤르타 오버호이저(Herta Oberheuser)가 법정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모습이다.
어제 포스팅 했던 아우슈비츠의 검투사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수용된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1940년 6월 14일 가톨릭 사제와 유대인을 포함한 폴란드의 정치범 728명이 최초로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사회활동과 병행하여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헤더 듄 맥아담(Heather Dune Macadam)이 작년 연말에 아우슈비츠에 공식적으로 수감된 최초의 유대인들은 997명의 슬로바키아계 유대인 여성들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였는데 제목은 “999: The Extraordinary Young Women of the First Official Jewish Transport to Auschwitz”이다.
이 책은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에디스 그로스먼(Edith Friedman Grosman) 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수감자들에게 지급된 옷은 전장에서 사망한 소비에트 군인들의 피에 젖은 군복이었고 신발은 얇은 천으로 다리에 묶은 나무판자였다고 한다.
추운 겨울 신발도 없이 생활해야 했던 유대인 여성수감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내용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독일경비원들이란 존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42년부터 여성경비병들이 아우슈비츠와 마자네크(Majdanek) 강제수용소에 배치되기 시작했었는데 전체 55,000명의 경비병 중에서 여성의 숫자는 3,5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수용소의 경비업무와는 무관한 교사, 미용사들을 차출하여 강제수용소의 간수임무를 맡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SS는 21세~45세까지의 독신여성들로 사상이 투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집된 여성들은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Ravensbrück concentration camp)에서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 각 수용소에 배치되었는데 교육의 주된 내용은 수감자들을 처벌하는 방법과 노동자들의 작업속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성 경비병력에 비해서 조금은 관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야말로 도살자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유대인 수용자들을 학살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이다.
예전 소련군의 발표에 따라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는 모두 4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약 250만 명이 유대인라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된 1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50만 명의 수감자들을 가스실에서 처형하도록 하는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이었다.
아우슈비츠 내에서 야수(The Beast)라 불렸던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유대인 여성에게 지루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한 마리아 만들(Maria Mandl)은 자기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 유대인 여성을 즉시 처형했으며, 수용자들이 줄을 서야할 때면 겁에 질린 수용자들 중에서 반드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수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자신을 바라본 수용자를 처형했다고 한다.
결국 미군에 의해서 체포된 그녀는 폴란드에 인계되었고 크라쿠프(Kraków)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1948년 1월 24일 36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마리아 만들(Maria Mandl)보다는 유대인 희생자들의 죽음에 적게 관여하기는 했지만 잔인하기로는 버금가는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르마 그레제(Irma Grese)다.
1900년대 영국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어린 여성이었던 이르마 그레제(Irma Grese)는 1945년 12월 13일, 22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르마 그레제(Irma Grese)는 굶주린 개들이 수용자들을 공격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희생된 사람들의 가죽으로 만든 전등갓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잔인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금발의 미녀, 또는 금발의 천사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한편 아우슈비츠에서 간수로 근무했던 독일여성 엘프리드 린켈(Elfriede Rinkel)은 1950년대 후반 미국으로 가서 살았으나 2006년에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Ravensbrück concentration camp)에서 근무할 때 개가 수용자들을 공격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로 추방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홀로코스트의 학살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직도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암울하기만 할 따름이다.